|
서구 지성계의 거목인 아르헨티나 대문호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가 쓴 소설 ‘바벨의 도서관’이 묘사한 장면이다. 자. 그렇다면 이곳에서 필요한 단 한 가지가 무엇이겠는가. 선별이다. 배치다.
이번에는 옷으로 가보자. 아마존에서 ‘드레스’를 검색하면 94만 7000벌이 검색된단다. 직접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일단 믿자. 충분히 그쯤 될 것이다. 범위를 좀 좁혀 ‘검정드레스’를 입력하면 24만 4000벌의 결과가 나온다고. 그런데 아무리 옷을 좋아한다고 해도 24만 4000벌의 검정드레스를 들여다보고 있을 사람은 없다.
내가 찾는 딱 한 벌의 드레스를 과연 어떻게 찾아낼 건가. 참 난감하다. 모아줄 순 있지만 골라줄 수는 없다. 소비자에게 적합한 옷을 어떻게 뽑아내나. 도서판매분야 1인자인 아마존이 패션시장을 장악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만약 아마존이 패션시장에도 굵직한 숟가락 하나를 얹고 싶다면 당장 해야 할 일은? 역시 선별이다. 배치다.
‘넘치는 것’이 넘쳐나는 시절. 이젠 많다는 것조차 감지하지 못하고 그냥 묻혀 산다. 그러니 “더 많은 것을 담아내려 노력해봐야 남들과 다른 차별성을 갖기 어렵다.” 그러니 어찌해야 하는가. 역으로 “덜어내는 작업을 해야” 한단다. 바로 큐레이션(curation)이다. 이는 경제학연구자로 파이낸셜타임스·가디언 등의 고정칼럼니스트인 저자의 주장이다. 그에 따르면 큐레이션이란 게 대단히 어렵거나 복잡한 장치가 아니다. 이미 사회 어느 곳에나 존재하는 것이니까. 바꿔 말하면 사회의 모든 구성원 역시 ‘큐레이터’일 수 있다. 무엇을 먹을지, 어디로 휴가를 갈지, 수많은 TV프로그램 중 어떤 걸 볼지를 다채롭게 큐레이팅할 수 있으니까.
책은 정보·상품·콘텐츠 등이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한 세상을 어찌 구해낼 건가란 저자의 관심을 입체적으로 반영한다. 덜어내기를 비롯해 선별·배치까지 전방위적인 큐레이션을 뽑아냈다. ‘더 적게 그러나 더 좋게’가 핵심이다.
뉴스가 넘쳐 뭐가 진실인지 헷갈린다면? 생산라인을 풀 가동했는데 회사가 멈춘 듯 미동도 안 한다면? 치약 하나 사려는데 수십가지가 달려든다면? 가고 싶은 여행지만 골라내려면? 이 같은 질문에 대한 저자의 대답은 ‘큐레이션’이다. 너무 많아 종국에 선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면 큐레이션만이 답이 될 수 있단 거다.
갑자기 등장한 큐레이션이 뜬금없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미술관·박물관의 문턱만 넘어서면 상황은 의외로 쉽다. 큐레이션은 ‘보살피다’란 뜻의 라틴어 쿠라레(curare)에서 유래했다. 맞다. 원래 미술계서 나온 말이다. ‘예술작품이나 문화재 등을 수집하고 보존·전시하는 일’이란 뜻이다. 비슷한 다른 뜻도 있다. ‘여러 정보를 수집·선별하고 편집하는 일.’ 그런데 좀 심심하지 않은가. 그래서 덧붙였다. ‘과잉정보를 덜어내고 새롭게 조합해 가치를 재창출하는 일’로. 한마디로 ‘과감하게 덜어내는 힘’이다.
저자가 확장한 이 의미를 들이댔더니 세상은 넓어지고 선택은 가벼워졌다. 뉴스큐레이션, 영화큐레이션, 마트큐레이션, 콘텐츠큐레이션, 디지털큐레이션 등이 가능해지더란 거다. 당연히 큐레이터도 굳이 미술계에만 둘 까닭이 없다. 축구감독 펩 과르디올라는 FC바이에른 뮌헨의 큐레이터로, 미술품에 관심이 많은 영화배우 리어나도 디캐프리오는 경매의 큐레이터가 될 수 있었단 말이다.
◇많이 가졌는데 왜 행복하지 않은가
“네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조건 더한다고 해서 창출되지 않아. 중요하지 않은 것, 가치 없는 것을 덜어내는 데서 생기지.”
앞의 ‘바벨의 도서관’으로 돌아가 보자. 저자는 이를 인터넷에 비유한다. 큐레이션의 여과과정이 없다면 인터넷 역시 보르헤스가 그린 ‘바벨의 도서관’의 악몽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논지다. 과잉현상으로 모든 생산과 모든 창조성은 무의미한 나열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빛 한 번 제대로 못 보고 묻히고 말 거라는.
그렇다고 마구잡이식 선별·배치는 아니다. 큐레이션도 윤리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판단이다. 큐레이션의 대상을 가운데 두고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 어떤 형태가 최선인지 늘 고려하는 것 말이다.
파피루스나 둘둘 말린 종이에 정보를 기록하던 그 옛날에는 굳이 필요치 않았던 일이다. 다른 방법이 있지도 절실하지도 않았으니. 칼 같은 결정권이 있어야 하지만 큐레이션의 궁극적인 덕목은 대상에게 가장 이타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과유불급시대…덜어내야 산다
어찌 보면 과잉문제는 세상서 벌어지는 갖가지 문제에 빗댈 때 비교적 ‘좋은 문제’ 축에 든다. 결핍과 부족 따위의 원초적인 난제를 해결하는 중에 나온 거니까. 하지만 ‘좋은’을 붙였다고 해서 문제가 아닌 건 아니다. 당장 과잉에 시달리는 영역을 꼼꼼히 따져보면 ‘심하다’란 생각이 안들 수가 없다. 예컨대 점심을 뭘 먹을지, 어떤 커피로 후식을 할지, 길 안내에 어떤 앱을 깔아야 할지에 대한 갈등이 대부분이니까. 이쯤 되면 미래 생존을 쥐고 있는 건 생산이 아니라 축소라는 게 자명하다.
“데이터 과잉시대에 희생되는 것은 결국 사람의 취향”이란다. 크리에이션이 전부인 시대는 저물었다. 그러니 쓸모없는 것을 덜어내 정제하고 배열하는 큐레이션으로 기우는 대세를 받아들이라고 저자는 조곤조곤 이른다. 큐레이션 덕에 잃었던 취향도 되살리고 ‘제3세계 착한커피’도 맛볼 수 있는 거라니까.


![월드컵까지 따냈다...스포츠산업 '생태계 파괴자' 된 빈살만[글로벌스트롱맨]](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3/11/PS23110500115t.jpg)

![[포토] 폭염 속 휴식취하는 건설 근로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3/08/PS23080100718t.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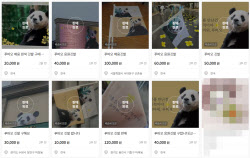


![[포토]2024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 금융투자 부분 수상자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4/PS24042501046t.jpg)
![[포토]박결 '핀을 보며 어드레스'](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4/PS24042500421t.jpg)
![[포토]'서울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 참석하는 이준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4/PS24042500759t.jpg)
![[포토]쾌적한 비행을 위해 봄맞이 세척](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4/PS24042500578t.jpg)
![[포토] '법의 날' 축사하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4/PS24042500502t.jpg)
![[포토]'기자회견 기다리는 황운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4/PS24042500358t.jpg)
![[포토]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하는 홍익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4/PS24042500272t.jpg)

![[포토]이주호 사회부총리, 40개 의대 총장 간담회…"학생·교수 복귀 총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4/PS24042400781t.jpg)
![[포토]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 정책 및 시장 영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4/PS24042400618t.jpg)
![[포토]박결 '버디를 생각해요'](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4/PS24042500437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