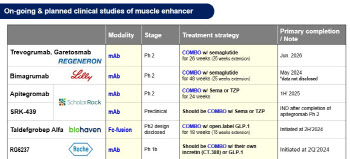2008년 금융위기 당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으로서 미국의 통화 정책을 이끌었던 벤 버냉키와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재무장관인 헨리 폴슨,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재무장관인 티머시 가이트는 최근 공동 집필한 ‘위기의 징조들’(이레미디어)에서 이 같이 경고했다.
|
‘위기의 징조들’에서 금융위기 당시 총책임자였던 저자들은 “어떤 요인이 당시 금융위기를 촉발시켰고, 어떤 이유로 금융 시스템 전체 위기로 확산됐는지 알아야 다른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들에 따르면 당시 금융위기는 무차별적인 대출에서 시작됐다. 특히 미국 가구당 주택담보대출액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63% 급증했다. 가계소득 증가율보다 훨씬 빠른 속도였다.
저자들은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세계 각국이 금융위기 재앙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금융 개혁안을 입법화하고 자본을 확충했지만 여전히 위기의 징후는 있다고 말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과도한 유동성, 치솟는 집값과 물가, 늘어나는 가계와 정부 부채, 자영업자와 부실기업 증가 등이 이어지면서 불안한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 경제 전문가와 잡지, 뉴스 등에서 심심치 않게 금융위기를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현상들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은 민간 금융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심해, 정치권은 정부의 금융위기 관리 기능을 상당부분 축소해왔다. 저자들은 “이는 다음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의 위기 대응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한다. 또 경제와 민주주의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소득의 양극화 등 오랜 시간에 걸쳐 굳어진 구조적 문제에도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저자들은 2022년에는 코로나19 확산이 진정세를 보이면서 넘쳐나던 유동성이 자산과 원자재 가격을 올리며 초인플레이션 현상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2023년은 폭증하는 수요, 원자재 슈퍼사이클, 미국의 유동성 태풍 등 사상 초유의 트리플 버블이 형성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특히 이들은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는 개방경제에 가계 재정 건정성이 부실해 그 피해가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버블 형성에 올라타고 붕괴 신호를 정확히 포착, 붕괴를 피할 수 있는 정보민감성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











![[포토]이가영,부드러운 티샷 공략](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100330t.jpg)
![[포토] '트릭 오어 트릿' 진행하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2211t.jpg)
![[포토] 송민혁 '이글 2개, 버디7개 잡은 날'](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0152t.jpg)
![[포토]치솟던 배춧값 대폭 하락…"물량 충분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1370t.jpg)
![[포토]삼성전자 반도체 영업익 4조](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1369t.jpg)
![[포토]하모니카 연주가 이윤석의 연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1230t.jpg)
![[포토]민통선 주민들 트랙터 시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1122t.jpg)
![[포토] 서울시예산안 설명하는 오세훈 시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0890t.jpg)
![[포토] 벤틀리모터스코리아, '더 뉴 컨티넨탈 GT 스피드' 공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0418t.jpg)
![[포토] 2024 서울 문화원 엑스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001770t.jpg)
![[포토]이가영,정상을 바라본다](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100331t.jpg)

![[단독]대출 74%가 담보·보증대출…위험 피하는 은행](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100154b.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