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 주인인 주씨는 지난 2010년 방문취업(H2) 비자로 중국 연변에서 우리나라로 왔다. 자동차부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자그마하게 10평짜리 식당을 차렸다. 외국인이라 대출이 어려웠지만, 가족들이 일해서 모은 돈을 보탰다.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면서 자동차나 실손의료비보험은 가입한 적이 있지만, 화재보험에 들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러던 찰나에 동포인 김씨를 만난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인 남편을 만나 결혼한 김씨는 주씨에게 우리나라 생활의 대선배다.
가입한 고객들의 직업도 중국음식점 주방장부터 공장 직원, 일용직 노동자 등 다양하다. 주씨처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다. 납입 기간 문제 때문이다. 영주권 비자(F5)와 결혼 비자(F1) 등을 가지고 있어 오랜 기간 거
|
이 점 때문에 김씨는 외국인들을 만나 가입을 설계하기 전 어떤 비자를 가졌는지부터 꼼꼼히 확인해 본다. 건강보험에 가입했는지도 꼭 알아본다. 정보 부족이나 비용 문제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이 많은 데 이들은 실제 지급한 치료비의 40%밖에 보상받지 못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은 139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 4000명(10.6%)가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 가족 등으로 체류 외국인이 많아지는 만큼 보험 설계사도 국제화되고 있다.
▶ 관련기사 ◀
☞[주간추천주]우리투자증권
☞삼성화재 인니법인 신용등급 'A-' 획득
☞[포토]삼성화재, 창립 61주년 기념 '고객서비스 헌장'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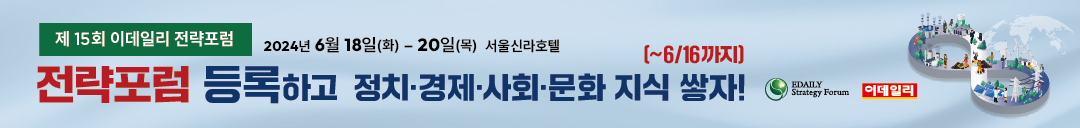

![월드컵까지 따냈다...스포츠산업 '생태계 파괴자' 된 빈살만[글로벌스트롱맨]](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3/11/PS23110500115t.jpg)

![[포토] 폭염 속 휴식취하는 건설 근로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3/08/PS23080100718t.jpg)








![[포토]유서연,핀 앞에 바로 붙어라](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0700731t.jpg)
![[포토] KPGA 선수권대회 한우 바비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0700810t.jpg)
![[포토]서울비댄스페스티벌, 스케이보더의 시범](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0700785t.jpg)
![[포토] 옥태훈 '침착하게 읽는 그린'](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0700389t.jpg)
![[포토] 국민권익위, 청년 현장 간담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0700658t.jpg)
![[포토] 인사말하는 라이베리아 대통령](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0700563t.jpg)
![[포토] 육군 장병들의 태권도 시범](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0600330t.jpg)
![[포토] 전가람 '트로피가 탐난다'](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0600332t.jpg)
![[포토] 셀트리온 4연패 도전하는 박민지](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0600130t.jpg)
![[포토] 현충일에 욱일기 내걸린 부산의 한 아파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0600293t.jpg)
![[포토]최은우,버디가 보인다](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0800032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