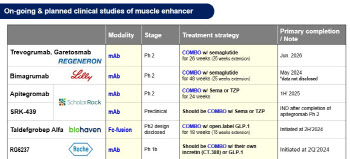소비자 “유례 없는 41.6배 누진율..산업용 손해 보전용”
|
|
2014년 당시 주택용 전력의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누진율을 계산하면 최고 단계의 기본요금(1만2350원)은 최저 단계의 기본요금(390원)의 32.13배다. 주택용 전력의 전력량요금을 기준으로 누진율을 계산하면 최고 단계의 전력량요금(797.5원)은 최저 단계의 전력량 요금(57.9원)의 13.77배다. 13.77배 누진율은 2011년 8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한 7단계 누진율(1350kW 초과)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원고 측이 주장하는 실질 누진율은 한전 추산 11.7배 누진율(전력량 요금 기준)보다 높다.
이는 외국의 사례와도 비교해 과도하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미국 뉴저지주의 경우 누진단계는 2단계, 누진율은 1.1배다. 누진제는 600kWh 기준으로 여름에만 적용된다. 영국 2단계(0.61배), 일본은 3단계(1.4배), 대만은 5단계(여름 2.4배, 나머지 1.9배)다.
원고 측은 이 같은 누진제를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주택용 전기요금으로 얻는 이익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012년 당시 주택용 전기요금(123.69원/kWh)은 산업용(92.83원/kWh)보다 30.86원/kWh 비쌌다. 그런데도 독점적인 전기판매 구조 때문에 누진제를 회피해 전기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일방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전기사업법(4조)을 위반했다는 게 원고 측 입장이다.
|
한전은 국내 주택용 전기요금 수준은 OECD 평균의 약 58%(2014년 기준)에 불과해 오히려 저렴하다는 입장이다. 한전에 따르면 국내 전기요금을 지수 100으로 볼 경우 독일은 382, 일본은 239, 미국은 120, OECD 평균은 172였다. 또 에너지절약 등 누진제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누진 단계, 누진율 등이 국가별로 다른 게 오히려 당연한 현상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전은 “누진제가 전기를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한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전기요금을 전기를 적게 사용한 사용자에게 되돌려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주택용 전기의 원가보상률(총수입/총원가)의 경우 85.4%(2012년), 89.6%(2013년)로 100%에 못 미쳐 원가부족액이 각각 1조1669억원, 7776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고객에 다소 불이익만으론 부족..종합 판단해야”
|
대법원은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추가 조건을 달았다. 대법원은 재작년 6월 판결(2013다214864)에서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결국 누진제로 인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한전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용도별 원가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등 불공정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충분치 않은 점, 2014년 소송 제기 당시와 달라진 현재 사회 분위기 등도 재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소송을 대리하는 곽상언 법무법인 인강 변호사는 “현행 전기요금 약관은 국회의 어떤 통제도 받지 않고 국가가 국민에게 징수할 수 있는 구조”라며 “더이상 국민의 재산권을 침탈하지 않도록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누진제 선고 임박]①42년 묵은 누진제, 법정에 서다
☞ [누진제 선고 임박]③누진제 뿔난 2만명 소송..연내 줄선고
☞ [기자수첩]한전이 '누진제 홍역'에서 벗어나려면
☞ 누진제 폭탄 맞은 871만 가구 8월 전기료 50%↑
☞ [현장에서]누진제 뭇매 맞는 산업부 장관에게













![[포토]이가영,부드러운 티샷 공략](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100330t.jpg)
![[포토] '트릭 오어 트릿' 진행하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2211t.jpg)
![[포토] 송민혁 '이글 2개, 버디7개 잡은 날'](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0152t.jpg)
![[포토]치솟던 배춧값 대폭 하락…"물량 충분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1370t.jpg)
![[포토]삼성전자 반도체 영업익 4조](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1369t.jpg)
![[포토]하모니카 연주가 이윤석의 연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1230t.jpg)
![[포토]민통선 주민들 트랙터 시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1122t.jpg)
![[포토] 서울시예산안 설명하는 오세훈 시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0890t.jpg)
![[포토] 벤틀리모터스코리아, '더 뉴 컨티넨탈 GT 스피드' 공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0418t.jpg)
![[포토] 2024 서울 문화원 엑스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001770t.jpg)
![[포토]이가영,정상을 바라본다](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100331t.jpg)

![[단독]대출 74%가 담보·보증대출…위험 피하는 은행](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100154b.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