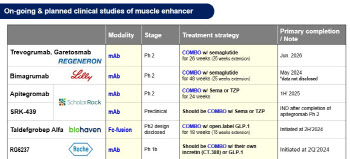9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영화 ‘1987’의 실제 사건을 돌아보며 고문기술자 이근안과 대공수사처 박처원 처장을 주목했다.
이날 김현정은 “요즘 ‘1987’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에서 6월 항쟁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현재까지 관객 수 400만을 넘겼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영화관을 찾으며 열기가 더 달아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 영화 속 인물들, 당시 실존 인물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 영화에서 가려진, 실제로도 꼭꼭 숨어 지내왔던, 하지만 우리가 꼭 짚어봐야 하는 핵심인물이 있다”고 전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인물은 바로 이근안. 그는 군사 독재 시절 경찰로 민주화 인사와 무고한 사람을 고문한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친 인물이다. ‘불곰’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으며 김철수라는 가명을 쓰기도 했다.
그는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의장을 맡았던 故 김근태 전 민주당 상임고문을 비롯한 민주화 운동 인사에게 전기 고문과 물고문 등 가혹한 고문을 일삼았다.
|
박처원 역시 대공수사처 수장으로서 민주화 운동 인사를 대상으로 불법 자백을 이끌어내고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은폐한 인물이다. 그는 1996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매체의 취재결과 박 치안감은 10년 전 노환으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고문 피해를 당한 김근태 전 의원 측이 1986년 1월 고문 가해자들을 고발했지만 직접 고문한 게 누군지 몰랐고, 고문 주장은 있지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은 1년 만에 무혐의로 종결됐다.
이후 이근안은 “당시 시대 상황에서 고문은 일종의 예술이자 애국 행위였다”면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나는 똑같이 할 것”이라고 밝혀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다.
현재 이근안이 허름한 다세대 주택 지하방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30년 전 이야기라 기억도 잘 안 난다”며 “관련된 사람들 다 죽고 혼자 떠들어봐야 나만 미친놈 된다”고 말했다.
김현정은 “당시 악행을 저지른 장본인들이 지금도 사과나 반성의 기미 없이 여전히 억울하다는 입장이라는 게 충격적이다”라며 “1987년 민주화를 향했던 몸부림은 어쩌면 현재 진행형인지도 모르겠단 생각도 든다”고 전했다.










![[포토]이가영,부드러운 티샷 공략](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100330t.jpg)
![[포토] '트릭 오어 트릿' 진행하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2211t.jpg)
![[포토] 송민혁 '이글 2개, 버디7개 잡은 날'](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0152t.jpg)
![[포토]치솟던 배춧값 대폭 하락…"물량 충분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1370t.jpg)
![[포토]삼성전자 반도체 영업익 4조](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1369t.jpg)
![[포토]하모니카 연주가 이윤석의 연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1230t.jpg)
![[포토]민통선 주민들 트랙터 시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1122t.jpg)
![[포토] 서울시예산안 설명하는 오세훈 시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0890t.jpg)
![[포토] 벤틀리모터스코리아, '더 뉴 컨티넨탈 GT 스피드' 공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0418t.jpg)
![[포토] 2024 서울 문화원 엑스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001770t.jpg)
![[포토]이가영,정상을 바라본다](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100331t.jpg)

![[단독]대출 74%가 담보·보증대출…위험 피하는 은행](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100154b.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