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행잉록의 소풍`에서 여학생들이 억압적인 교육을 받는 학교로 등장했던 마틴데일 홀. 여기서의 하룻밤은 어둠과 적막이 뼈에 스며드는 듯한 경험이다. | |
‘행잉록의 소풍’엔 마력 같은 게 있었다. 신비만 남겨두고 설명은 거세한 영화. 실종의 모티브가 그 영화의 전부였다. 처음 봤을 때부터 강력히 사로잡혔다. 다 보고 나니 꼭 촬영지에 가고 싶었다. 기회는 십수년 만에 찾아왔다. 호주를 생각하니 그 영화가 떠올랐다. 지도를 샅샅이 뒤졌다. 여러 차례 전화도 걸고 이메일도 썼다. 어서 신비의 공간에 발을 딛고 싶었다.
호주 남쪽 해안 도시 애들레이드. 공항에서 예약해둔 차에 올랐다. 첫 목적지는 마틴데일 홀. 애들레이드 북쪽 160㎞ 지점에 있었다. 잔뜩 흐렸다. 낮인데도 어두컴컴했다. 도시를 벗어나자 폭우까지 쏟아졌다. 거센 바람이 비를 포말로 갈아 날렸다. 뿌연 세상 속 구비구비 끝없이 이어진 길. 현실감이 사라졌다. 달릴수록 오히려 멀어지는 것 같았다. 차를 몰던 토니가 씩 웃었다. “으스스하죠?” 그렇긴 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좋았다. 이건 몽환적인 세계로 가는 여정이니까.
극중 학교로 나온 마틴데일 홀에 닿았다. 2층 석조 건물이 솟구치듯 나타났다. 반경 5㎞ 안에 인가라곤 없었다. 여학생들이 유폐되듯 기숙했던 곳. 여기서 교육은 억압의 동의어였다. 현관에 매달린 종을 흔들었다. 집 관리인 트레이시가 웃으며 맞았다.
대저택은 우아했다. 그리고 왠지 스산했다. 홀을 가로질러 정면의 계단을 올랐다. 하필 모두 열세 개. 영화 속 모습 그대로 인상적이었다. 2층에서 아래층이 훤히 내려다보였다. 마틴데일 홀은 1880년에 건립됐다. 호기롭게 지은 사람은 스물한 살 청년.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직후였다. 그러나 왕자 같은 생활은 딱 10년이었다. 서른을 넘기자마자 사치로 파산했다. 흔히 서구의 고택들은 관람객만 받는다. 그러나 이곳은 운영방식이 독특했다. 옛 모습 그대로인 방에서 묵을 수 있었다. 객실은 모두 10개. 예약한 대로 ‘화이트룸’으로 갔다. 이 영화 첫 장면을 찍은 곳. 바로 극중 주인공 미란다의 방이었다. 높은 천장과 빛 바랜 벽지. 라디에이터 외엔 모두 낡은 고가구였다. 세월을 느끼는 감각은 후각이었다. 1층에 틀어놓은 음악이 갑자기 멈췄다. 어느새 비도 그쳤다. 열린 창문으로 긴 그림자가 넘어왔다. 천장에서 전등이 목 매듯 달려 흔들렸다. 늦은 오후였고 기이한 정적이었다.
아래에서 징이 울렸다. 적막 속 징소리는 원을 그리며 퍼졌다. 그리곤 벽에 부딪쳐 허물어졌다. 저녁이 준비됐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트레이시가 요리한 저녁을 먹었다. 부부인 수지와 스티븐 그리고 나. 손님은 딱 셋이었다. 부부는 자상한 얼굴로 말을 붙여왔다. 그러면서 그들끼리는 종종 쏘아붙였다. 영락없이 오래 산 부부의 모습이었다. 식사는 훌륭했다. 대화도 즐거웠다. 하지만 말은 가끔씩 끊어졌다. 그러면 침묵이 바로 목덜미를 눌렀다. 일을 마친 트레이시는 바깥 별채로 갔다. 스티븐 부부가 피곤하다며 일어섰다. 혼자 남아 커피를 마셨다. 잔에 담긴 그늘이 목구멍으로 흘러갔다.
침실로 돌아와 누웠다. 낡은 나무 문은 닫히지 않았다. 대신 내내 삐걱대며 세월을 여닫았다. 날이 밝으면 이곳을 떠날 수 있을까. 아침 해가 다시 떠오르긴 할까. 잠들지 않고도 수십차례 꿈을 꿨다. 좁은 폐곡선 위에서 영원히 맴도는 느낌. 아래층 괘종시계가 무겁게 네 번 울렸다.
 | |
| ▲ 1.아래에서 올려다 본 행잉록은 영화 속 모습 그대로 위압적이었다. 2.낮에도 괴괴한 분위기가 감도는 마틴데일 홀. 3. `행잉록의 소풍` 에서 사라진 소녀들. | |
멜버른을 벗어나 북쪽으로 달리길 한 시간. 우드엔드 근처에 행잉록이 있었다. 입구의 바위엔 작은 글귀가 새겨졌다. “미스터리를 체험하세요.” 호주에서 ‘행잉록의 소풍’은 고전이었다. 이 영화가 개봉된 것은 30여년 전. 허나 사람들은 여전히 행잉록을 찾았다. 매점에서 스콘(Scone)과 라임 주스를 챙겼다. 영화 사진을 곁들인 원작 소설도 샀다. 그렇게 ‘소풍’ 준비를 마쳤다.
행잉록은 사실 그리 높지 않았다. 해발 711m였으니까. 그러나 바위로만 이뤄져 위압적이었다. 이름대로 바위가 곳곳에 매달려 있었다. 온통 세상으로 쏟아질 듯 주저하며. 화산활동이 빚은 조면암이 산을 이뤘다. 암석들은 엉겨붙어 굴과 길을 만들었다. 바위 사이를 누비다 보면 곧 길을 잃었다. 주위가 금세 어두워졌다. 빛을 가리기엔 구름 한 점으로 충분하다.
정상에 우뚝 선 바위에 올랐다. 저 멀리 작은 마을이 한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적막은 비명(悲鳴)까지 삼킬 것 같았다. 극중 이곳을 찾은 청년의 외침을 삼켰듯. 그 모든 사건과 세상사의 비밀까지. 침묵은 거기서 가능한 단 하나 일이었다. 산 아래에선 여러 사람들을 만났다. 그러나 정상엔 아무도 없었다. 날씨는 을씨년스럽고 바위는 차가웠다. 암석에 누우니 폐 대신 피부가 호흡했다. 산에선 촉각이 시각을 지배했다. 가끔 새가 날았다. 바람이 불면 작은 숲이 거세게 흔들렸다. 그러나 돌은 내내 침묵했다. 돌은 무심했다.
‘행잉록의 소풍’(Picnic At Hanging Rock·1975)은…
많은 영화 마니아들이 전율로 기억하는 걸작이다. ‘트루먼 쇼’ ‘죽은 시인의 사회’로 유명한 호주 출신 피터 위어 감독은 서른한살 때 45만달러의 저예산으로 이 시대극을 신비롭고 우아하게 연출해 호주인들이 자랑스러워 하는 국민영화로 만들었다.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지만 내내 초현실적이고 몽환적인 분위기가 으스스한 긴장을 잃지 않는 개성 넘치는 스릴러이다.
빅토리아 시대의 억압적 환경 속에서 신부 수업을 받아오던 여학생들이 모처럼 행잉록이란 곳으로 소풍을 간다. 떠날 때부터 이상한 조짐을 보였던 미란다를 비롯해 세 소녀가 흔적도 없이 실종되고 찾아나선 여교사까지 없어진다. 함께 소풍을 갔던 소녀들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서지만 도무지 실마리조차 찾을 수 없다.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여행수첩= ‘행잉록의 소풍’ 주요 촬영지는 극중 학교로 나온 마틴데일 홀과 행잉록 국립공원을 들 수 있다.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외진 곳에 있는 마틴데일 홀에 가려면 사전에 인터넷 홈페이지(martindalehall.com)를 통해 미리 교통-숙박 정보를 파악하고 예약하는 것이 좋다. 126년된 이 우아한 대저택에서 숙박까지 하면 잊지 못할 추억이 된다. 마틴데일 홀에 가기 전 애들레이드와 캥거루 섬에서 2-3일 관광을 겸할 수 있다. 행잉록 국립공원은 멜버른에서 차로 1시간 걸리는 우드엔드 근처에 있다. 영화를 보고 찾아가면 독특한 풍광으로 극의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다. 교육과 문화의 도시 멜버른 구경을 마치면 절경의 해안길이 이어지는 그레이트 오션 로드에 꼭 한 번 들러볼 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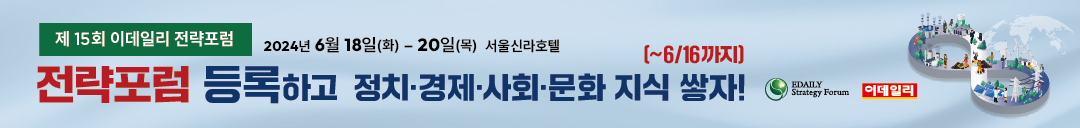

![월드컵까지 따냈다...스포츠산업 '생태계 파괴자' 된 빈살만[글로벌스트롱맨]](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3/11/PS23110500115t.jpg)

![[포토] 폭염 속 휴식취하는 건설 근로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3/08/PS23080100718t.jpg)






![[포토] 한우, 홍콩 MZ 인기](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0301093t.jpg)
![[포토] 한국P&G, 이마트 경품 기획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0300962t.jpg)
![[포토]'발언하는 서병수 선거관리위원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0300842t.jpg)
![[포토]LH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토론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0300783t.jpg)
![[포토] 경총,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0300771t.jpg)
![[포토]의원총회, '악수하는 나경원-이철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0300737t.jpg)
![[포토]서울시, "K-군인, 당신이 영웅"…서울꿈새김판 호국보훈의달 새단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0300657t.jpg)
![[포토]英 여성작가 캐서린 맨스필드의 시 ‘정반대’로 새 옷 입은 교보생명 광화문 글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0300618t.jpg)
![[포토] 암참(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0300617t.jpg)
![[포토]조국혁신당, '로텐더홀에서 첫 최고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0300390t.jpg)

![[포토]이예원, 우승 주먹 불끈](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0200429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