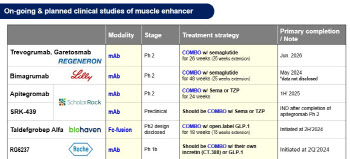[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베르크로스터스 하우스 블렌드 아이스 라떼…뭐라고요?”
서울 가로수길 한 카페를 찾은 30대 직장인 박모 씨는 커피를 주문하는 데 애를 먹었다. 메뉴판이 죄다 영어로 쓰여 있는 데다 필기체라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다. 박씨는 “버젓이 우리말과 글이 있는데 왜 굳이 영어를 쓰는 것이냐”며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 | 한글날인 9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옆에서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
|
제577돌을 맞이한 9일 ‘한글날’에도 각종 외래어와 신조어는 우리 일상 생활 곳곳을 파고들었다. 서울 도심 번화가에는 알파벳과 한자, 일본의 가타카나와 히라가나 등 외국 문자로 쓴 간판과 상호가 빼곡하게 늘어섰다. 한 꽃집은 ‘평화’라는 뜻의 라틴어 ‘PACEM’ 간판을 걸었고, 이발소의 경우 별다른 설명 없이 ‘Barber shop’(바버 샵)이라고만 적어놓았다. 순수 우리말로 간판을 내건 곳은 약국과 학원 등 소수에 불과했다.
60대 이상 연령층은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주문할 때 더 큰 장벽을 느낀다. 모든 메뉴가 영어로 적혀 있는가 하면, ‘테이크아웃’(take-out), ‘세팅’(setting), ‘오더’(order), ‘리필’(refill) 등 외국어가 빈번하게 쓰이고, ‘빌지’(bill+紙)라는 정체불명의 합성어도 통용되고 있었다. 60대 주부 강모 씨는 “주문을 여러 번 시도해도 되지 않아 키오스크에 익숙하지 않은 스스로를 탓했는데, 알고 보니 ‘Sold out’(품절)이더라”며 “이 나이 먹고 키오스크에 이젠 영어까지 공부해야 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 | 영어로 적힌 메뉴판(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정체불명의 신조어도 난무했다. 매년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신조어를 얼마나 많이 아는지 시험하기 위한 능력 평가도 생겼다. △돔황챠(도망쳐) △킹받네(열받네) △꾸웨엑(후회해) △디토합니다(인정합니다) △어라랍스타(감탄사) 등 그 출처와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말들이 대부분이다. 무분별한 줄임말도 횡행하고 있다. ‘알잘딱깔센’은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있게’의 줄임말로 처음 들은 사람들은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2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한 친구가 ‘돔황챠’라고 쓴 것을 보고 ‘그건 차 종류냐’고 물어봤다가 다른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다”며 “벌써부터 혼자만 트렌드에 뒤처지는 건가 싶어 불안했다”고 말했다. ‘급식충·틀딱충·맘충·애비충’ 등 혐오적 표현도 일종의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으로 자리 잡았다. 40대 주부 권모 씨는 “중학생인 첫째가 초등생인 둘째에게 ‘어휴 저 급식충 XX가’라고 말해 깜짝 놀랐다.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냐고 다그치니 ‘킹받게 하네’라고 대꾸를 하더라”며 “요즘 또래 애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라는데 못 쓰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는 외래어와 신조어를 남용할 경우 소통에 장애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가급적 표준어를 사용할 것을 권했다. 김슬옹 세종국어문화원 원장은 “언어는 사람다움을 지키고 가꾸는 가장 중요한 문화이자 도구”라며 “우리가 평소 쓰는 모든 말들을 잘 살피고 보듬어서 제대로 부려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건범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 대표는 “법과 제도, 정책 등 우리 사회에서 공적인 소통을 할 때 우리 말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면 이해하지 못하거나 못 알아듣는 국민이 있을 수 있다”며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사적 언어생활에서도 “신조어 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배려하는 언어생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포토]이가영,부드러운 티샷 공략](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100330t.jpg)
![[포토] '트릭 오어 트릿' 진행하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2211t.jpg)
![[포토] 송민혁 '이글 2개, 버디7개 잡은 날'](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0152t.jpg)
![[포토]치솟던 배춧값 대폭 하락…"물량 충분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1370t.jpg)
![[포토]삼성전자 반도체 영업익 4조](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1369t.jpg)
![[포토]하모니카 연주가 이윤석의 연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1230t.jpg)
![[포토]민통선 주민들 트랙터 시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1122t.jpg)
![[포토] 서울시예산안 설명하는 오세훈 시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0890t.jpg)
![[포토] 벤틀리모터스코리아, '더 뉴 컨티넨탈 GT 스피드' 공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0418t.jpg)
![[포토] 2024 서울 문화원 엑스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001770t.jpg)
![[포토]이가영,정상을 바라본다](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100331t.jpg)

![[단독]대출 74%가 담보·보증대출…위험 피하는 은행](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100154b.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