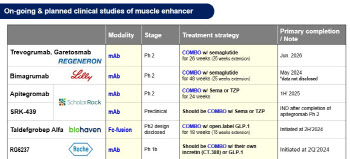|
이데일리가 진행하던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E: Survey of Credit Rating by Edaily)에도 변화가 있었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2차례에 걸쳐 하던 SRE를 올해부터 연간 하반기 1회로 줄이기로 했다. 사실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인 작년 말에 결정한 사안이었다. SRE를 처음 시작했을 당시 만연했던 신용평가 문제점이 대부분 해소됐고 크레딧 이벤트 빈도수도 현저히 줄어든 상태였기에 내린 결단이었다. 매회 SRE를 진행할 때마다 주제를 뭐로 잡아야 할지부터가 고민일 정도로 시장 이슈가 뜸해졌다. 아직 우리나라 회사채 시장 규모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작은데다 비우량 회사채 시장이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했지만, 저금리에 시중 갈 곳 없는 돈이 회사채 시장으로 몰리면서 비우량 기업들도 회사채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가 수월했던 시기였다.
그러다 올해 예상치 않게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터지자 두 가지 생각이 들었다. 연 1회로 바꾸지 않았다면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올 4월에 SRE를 진행했어야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야말로 크레딧 시장 진단을 해야 한 것 아닌가였다. 아차 싶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4월 기업 회사채 만기가 몰려 있어 ‘죽을 사자, 死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데 SRE를 진행했다면 설문조사가 제대로 이뤄졌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다. 그땐 회사채 시장에 몸담은 사람들 대부분이 “내가 다니는 이 회사가 과연 무사할까”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살벌했던 시기라 설문독려조차 쉽지 않았을 게 뻔하다.
그러나 뜯어보면 안심할 수 없다. 등급전망 ‘부정적’(negative) 꼬리표를 달고 있거나 하향검토 등급감시대상에 오른 기업은 얼추 100개가량 된다. 주요 신용평가 대상 기업이 200여개, 넓게 보면 300여개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곳 중 한 곳, 넓게는 3곳 중 한 곳꼴로 하향 위기에 놓인 셈이다.
그래서 혹자는 폭풍 전야 같다는 얘기도 한다. 생사를 오가는 기업의 운명을 지금은 인공호흡기로 잠시 연명해놓은 것일 뿐이라는 판단에서다. 팬데믹이 선언되고 글로벌 경제가 휘청이자 전 세계가 앞다퉈 금리인하, 확장적 재정정책에 나서고 심지어는 국민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현금살포 작전까지 썼다. 우리나라도 채권시장안정펀드, 증시안정펀드, 저신용회사채·CP매입기구(SPV),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 등을 숨가쁘게 가동했고 기간산업안정기금,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 대출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와 같은 정책을 봇물처럼 쏟아냈다. 어찌 보면 그 힘으로 이렇다 할 크레딧 이벤트 없이 코로나19 발생 후 근 1년을 버틴 것이다.
이렇게 저렇게 틀어막아 놓고 억지로 기금 투입하면서 연명해놨던 크레딧 이슈들이 줄줄이 터질 날이 머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런 기업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SRE 자문단 회의에서는 “백신 만드는 회사에게 물어보라”라는 답이 나왔다.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백신이 전세계 모든 이들이 맞을 수 있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릴 것이다.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제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시대로, 코로나19만 해결되면 상황이 나아지겠지라는 희망도 갈수록 옅어지고 있다. 리스크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31회 SRE(Survey of credit Rating by Edaily) 책자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포토]이가영,부드러운 티샷 공략](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100330t.jpg)
![[포토] '트릭 오어 트릿' 진행하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2211t.jpg)
![[포토] 송민혁 '이글 2개, 버디7개 잡은 날'](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0152t.jpg)
![[포토]치솟던 배춧값 대폭 하락…"물량 충분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1370t.jpg)
![[포토]삼성전자 반도체 영업익 4조](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1369t.jpg)
![[포토]하모니카 연주가 이윤석의 연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1230t.jpg)
![[포토]민통선 주민들 트랙터 시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1122t.jpg)
![[포토] 서울시예산안 설명하는 오세훈 시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0890t.jpg)
![[포토] 벤틀리모터스코리아, '더 뉴 컨티넨탈 GT 스피드' 공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0418t.jpg)
![[포토] 2024 서울 문화원 엑스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001770t.jpg)

![[포토]이가영,정상을 바라본다](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100331t.jpg)
![[단독]新폐렴구균 백신 국내 허가…무료접종 판 흔들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100631b.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