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영 양과 동은 양은 같은 아파트의 1층과 18층에 살았건 이웃으로 2살 차이가 났음에도 친자매처럼 지낼 정도로 사이가 좋았다.
두 학생이 실종되던 날, 은영 양은 이른 아침부터 동은 양의 집에 놀러 왔다. 이날 동은 양의 엄마는 오전 10시께 일찍 집을 나섰고, 외출하기 전 두 사람에게 “밖에 나가서 놀 거냐”고 물었다. 은영 양과 동은 양은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놀겠다”고 대답했다.
동은 양의 엄마가 나가면서 은영 양, 동은 양, 동은 양의 언니까지 총 3명이 집에 남아 있었다. 마침 동은 양의 언니도 학원에 가야해서 약 11시쯤 집을 나섰고, 이때에도 두 학생은 “(집에서) 안 나간다”고 말했다고 한다.
|
양쪽 부모들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아이들이 학교나 가정에서 착실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만큼 자발적으로 가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해 납치 등 범죄의 표적이 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
이때 한 버스기사가 “당일에 두 아이를 태우고 내려줬는데 집 앞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한 후 집이 있는 아파트 단지 안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이후 최면수사를 실시한 결과, 정확히는 두 아이까지 포함해서 총 6명이 내렸는데 두 아이 뒤에 한 남자가 따라갔다는 진술이 나왔다. 이 외에도 여러 목격담이 나오며 경찰이 탐문 수사를 벌였으나 두 여학생의 행적을 찾을 수는 없었다.
해당 사건은 2019년 양산경찰서에서 경남경찰청 미제사건팀으로 이관됐다. 다행히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새로운 단서를 찾으면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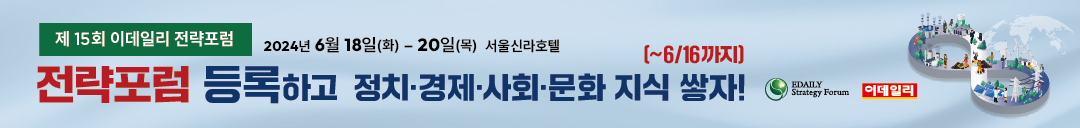

![월드컵까지 따냈다...스포츠산업 '생태계 파괴자' 된 빈살만[글로벌스트롱맨]](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3/11/PS23110500115t.jpg)

![[포토] 폭염 속 휴식취하는 건설 근로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3/08/PS23080100718t.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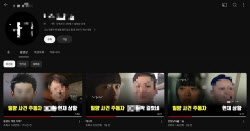



![[포토]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0600014t.jpg)
![[포토] 한국전 하루 앞둔 싱가포르 대표팀 훈련](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0500123t.jpg)
![[포토]22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우원식 당선](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0500721t.jpg)
![[포토] 터전을 잃어가는 동물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0500557t.jpg)
![[포토]굳게 닫힌 소비자의 지갑](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0500537t.jpg)
![[포토]이정식 장관, 중소기업 협회·단체 간담회 인사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0500444t.jpg)
![[포토]최고위, '발언하는 전은수 최고위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0500431t.jpg)
![[포토] 구강보건의 날 캠페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0500414t.jpg)

![[포토]이예원, 우승 주먹 불끈](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0200429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