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영수 산업에디터] “플랜B는 없습니다.”
최근 미국 언론을 통해 미 법무부(DOJ)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 절차에 부정적 기류가 감지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국내에서도 이런저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와 인수 주체인 대한항공은 “차선책은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플랜B를 마련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는 생각할 수도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 절차는 지난 2020년 11월 첫 발표이후 3년째 접어들고 있다. 총 14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업결합 승인은 현재 11개국을 통과했다. 최종 관문이라 일컫는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3개국만 남은 상태다. 올해 말 최종 완료될 것이란 기대감 속에 이번 미 언론의 부정적 전망은 찬물을 끼얹는 모양새다. 이들 국가 중 한 국가라도 기업결합에 불승인하면 나머지 국가의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은 사실상 무산될 수밖에 없어서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대한항공은 지난 12일 DOJ와 대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바 없다’는 내용과 함께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 나가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받았다”며 진화에 나섰다. 미국에 앞서 EU 집행위는 대한항공의 답변서 등을 종합해 오는 8월3일까지 합병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업계 안팎에선 EU의 경우 대한항공이 6월까지 제출해야 하는 경쟁제한 우려 해소 방안에 큰 문제가 없다면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앞서 EU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영국이 지난 3월1일 일부 슬롯(항공기 시간당 이·착륙 허용 횟수)과 노선 운수권 반납 등을 조건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한 전례가 있어서다.
이런 희망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불발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 파장은 국익을 넘어 국내 항공산업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미칠 전망이다. 당장 합병이 어그러지면 아시아나항공의 회생은 불가능할 것이란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올해 1분기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비율(연결 기준)은 2000%대로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하다. 대한항공이 이미 투입한 1조원 외에 남아있는 8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마지막 희망인 상황이다.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1만명 가량의 임직원 중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도 높다.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황금 노선 운수권과 슬롯도 지키기 어려울 공산이 크다. 더 큰 문제는 양사 간 합병이 불발될 경우 지난 2020년 산업은행이 대한항공 회생을 위해 한진칼에 투입한 8000억원의 공적자금마저 회수키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 주도의 항공산업 빅딜이란 점에서 산은을 포함한 정부의 책임론도 수면 위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셈이다.
기업결합심사를 위해 국내·외 로펌 및 자문사 비용으로만 1000억원 이상을 투입한 대한항공으로선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상황이다. 5개팀 100여명으로 구성된 국가별 전담 전문가 그룹을 상설 운영 중인 대한항공은 한-미 노선의 승객이 대다수 한국인이라는 점과 경쟁제한이 우려되는 노선이 신규 항공사의 진입과 증편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 당국에 호소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번 항공 빅딜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심사 당국의 경쟁제한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합리적 수준의 시정조치안을 제안하고 설득하는 묘수도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는 합병을 주도한 정부의 전폭적인 협력과 지원을 전제로 한 필승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플랜B를 마련해야 할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기대한다.


![월드컵까지 따냈다...스포츠산업 '생태계 파괴자' 된 빈살만[글로벌스트롱맨]](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3/11/PS23110500115t.jpg)

![[포토] 폭염 속 휴식취하는 건설 근로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3/08/PS23080100718t.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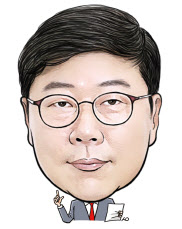





![[포토]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9%...과일, 채소값은 고공행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0600252t.jpg)
![[포토]'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목마'](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0600238t.jpg)
![[포토]휘발유값 상승세 둔화](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0600213t.jpg)
![[포토]영화 '범죄도시4' 흥행 질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0600148t.jpg)
![[포토] 김홍택 '스크린 황제의 필드 정복'](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0500327t.jpg)
![[포토]박현경 '놀란눈은 커다래지고'](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0500276t.jpg)
![[포토] 길놀이 공연 보며 즐기는 어린이날 연휴 첫 날](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0400242t.jpg)
![[포토]박결 '돋보이는 미소 손인사'](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0400173t.jpg)
![[포토] 이정환 '버디 성공하며 갤러리에 인사'](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0400154t.jpg)
![[포토]정지민 '투온을 노린다'](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0300580t.jpg)
![[포토]박지영 '우승,두 주먹 불끈'](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0500367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