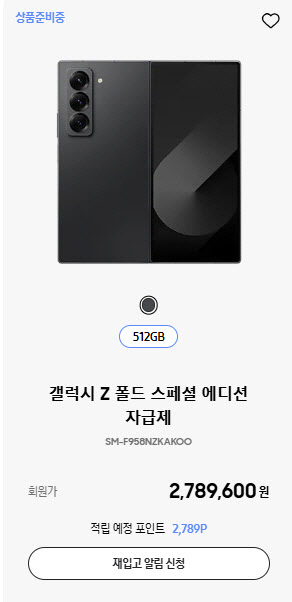|
때문에 FA 자격을 얻은 톱 클래스 선수들은 한번쯤 해외 무대를 노크해 보곤 한다.
그러나 이종범은 달랐다. 그는 한국 프로야구 선수 출신으로는 일본 프로야구에 진출한 첫 번째 타자였다. 하지만 그의 이적은 그의 뜻이 아니었다.
이종범은 “선동렬 선배가 팀을 떠난 뒤, 나라도 끝까지 지켜야겠다고 마음 먹었었다. 하지만 구단의 결정은 달랐다. 구단주님(당시 박건배 해태 회장)까지 나서서 나를 설득하셨다. 눈물을 머금고 일본으로 향했던 것”이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해태는 열악한 재정 탓에 선수들에 대한 지원이 가장 나쁜 팀이었다. 한때 “너 해태 보낸다”는 말은 프로야구 선수들을 은근히 옥죄는 무기였을 정도다.
이종범의 바람과는 달리 구단 재정은 날로 악화됐다. 결국 그를 주니치에 넘겨주고 받게 될 이적료가 절박한 상황까지 몰리자, 그의 일본 진출을 앞장서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종범의 일본 생활은 고난이 절반이었다. 가와지리의 공에 맞고 팔꿈치가 부러진 이후로는 좀처럼 페이스를 찾지 못했다. 부진과 겹치며 더욱 지독해진 향수병은 그에게 원형 탈모증이라는 또 다른 아픔을 가져다 줬다.
그가 한국에 돌아온 뒤 한 기자가 원형 탈모를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아니, 이 좋은 데 살면서 왜 그러느냐”고 위로했던 일화는 이종범이 얼마나 타이거즈와 고향을 사랑했는지 가장 잘 드러내 준다.
지난 2009년 완성된 10번째 우승은 그런 이종범의 바람이 작은 결실로 이어진 결과였다. KIA 포수 김상훈은 “손영민이나 양현종 등 팀의 주축이지만 아직 경험이 부족했던 선수들은 내가 봐도 걱정될 만큼 얼어 있었다. 얼굴과 입술이 허옇게 질려 있었다.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몰라 모두들 걱정만 하고 있었다. 그럴 때 선배님이 후배들에게 다가가 “뭘 긴장허냐, 암씨롱도 안한 것을. 타이거즈는 한국시리즈서 한 번도 진 적 없다”며 등을 두드려줬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큰 힘이 됐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런 이종범이 이제 타이거즈를 떠나게 됐다. 벌써 두 번째 이별이자 선수로서는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됐다.
아마도 그는 이별을 이야기하며 애써 담담한 척 할 것이다. 하지만 가슴 속에는 이미 굵은 눈물이 흐르고 있을 것이다. 이별은 아무리 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니 말이다. ▶ 관련기사 ◀ ☞'전격 은퇴' 이종범 "마무리 잘 하고 싶었는데..." ☞[단독]'바람의 아들' 이종범 전격 은퇴...타이거즈 떠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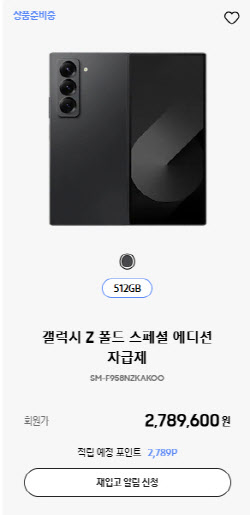




![[포토] 안병훈 '버디 찬스를 만드는 정교한 컨트롤'](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2600583t.jpg)
![[포토]장수연,목표 방향을 본다](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2600333t.jpg)
![[포토]정수빈,컷 통과 기념 회식은 여기죠](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2500687t.jpg)
![[포토]뉴진스, '대세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2501495t.jpg)
![[포토] 안테나숍 힙촌일기 오픈](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2501135t.jpg)
![[포토] 안병훈 '호쾌한 장타력으로 승부한다'](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2500202t.jpg)
![[수정본] 쇠백로의 아침식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2500842t.jpg)
![[포토] 영등포고가차도 48년만에 퇴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2500769t.jpg)
![[포토]김소이,그린 중앙을 향하여](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2400637t.jpg)

![[르포]‘이것이 미래다’ 벤츠 마이바흐· S클래스· EQS 혼류 생산](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2700171t.jpg)
![[포토]서연정,핀 앞에 떨어져라](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2600607t.jpg)
!['불닭'보다 난리라는 이 라면…농심 '비장의 한 수' 통할까 [먹어보고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2700090b.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