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란 명지대 미래융합경영학과 교수]챗 GPT의 등장으로 AI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당초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AI의 진화 속도에 경탄을 너머 우려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 2040년경으로 예상되었던, 범용 AI가 인간을 초월하는 특이점(싱귤래리티)이 조만간 도래하거나 이미 도래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AI의 초고속 진화가 인류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하기 위해서 개발을 잠시 멈추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AI의 대두로 인류의 생활 패턴이 근원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시대에 돌입한 것은 분명한 현실로 보여진다,
이제 국가, 정부, 기업 그리고 개인 모두 이 흐름을 거스르면 생존할 수 없다는 압박감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 생활을 책임지는 정부, 공공부문의 진정한 의미의 대개혁이 불가피하지만, 오히려 이 부문이 기업이나 개인에 비해서 반응속도가 둔감해 보이는 것은 필자만의 느낌이 아닐 것이다.
그간 공공부문의 개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단골 메뉴였지만 우리가 실감할 수 있을 만한 성과는 보여주지 못했다. 역설적으로 공공부문의 규모는 점점 더 확대돼 2022년 1558개 공공기관에, 임직원 수는 약 160 만명이며, 연간 인건비 규모는 110조, 자산 규모는 정부 총 자산의 78%에 달하는 969조, 예산 규모는 751조로 정부 예산의 1.24배에 달하고 있다(2021년 기준).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개혁할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방향 제시조차 불분명했던 듯 하다.
공공부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기업의 경우에는 더욱 더 그렇다. 결국은 큰 방향성의 정립, 장기적 관점에서의 존재가치 등은 차치되고, 임금체계 개편, 조직축소, 단기적 정부목표 수행체제 구축 등에 중점이 놓여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 또한 최근에는 공기업의 공공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면서 결국은 관의 지배가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결과를 초래한 면이 있다. 더우기 공기업평가라는 대의명분 하에 대규모의 교수진들로 편성된 평가위원을 통해 경영 활동의 세세한 부문까지 개입하다 보니, 활력있는 경영은 거의 자취를 감춘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다. 경영실적을 엄정히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지만, 평가항목이 초세분화되고, 다수의 평가위원이 가담함으로써 지엽적인 문제에 매이게 되고, 또한 공정성이 오히려 위협받는 측면도 없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오랜 기간 공직에 몸 담았던 분들조차 최근의 공기업에 대한 관의 지배력은 40여년 전 보다도 더 강화됐다고 한다.
공기업도 기업인 만큼, 창의성이 마음껏 발휘되도록 해야 하지만 그간의 공기업개혁 결과는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시점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MZ세대 공무원과의 대화에서 대통령 스스로 영업사원이 되겠다고 발언하며, 공무원들에게는 ‘기업처럼 일하는 인재들’이 될 것을 요청하면서 기업 마인드를 강조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기대를 갖게 한다.
AI 시대의 공공부문, 특히 공기업은 공공성도 놓치기 어려운 과제이지만,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도 진취적이고 창의성이 발휘되는 모습이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위해선 공정하고 청렴한 리더쉽에 근거한 자율경영이 보장되고, 결과로 평가받고 성과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대전환돼야 할 것이다.
평가라는 도구 속에서 팽팽해야 할 기업논리가 오히려 느슨해지고, 관의 지배력을 사실상 강화하던 그간의 ‘공기업 개혁’을 제대로 시작하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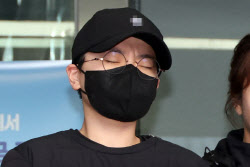


![[포토] 롯데 오픈 공식 포토콜 '이번주 많, 관, 부 부탁드려요'](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7/PS24070300225t.jpg)
![[포토] 문지욱 '쾌조의 컨디션으로 선두를 꿰차다'](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7/PS24070300221t.jpg)
![[포토]끝나지 않는 의정갈등](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7/PS24070300652t.jpg)
![[포토]최상목 부총리, "경제 구조개혁 착수할 시기"](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7/PS24070300610t.jpg)
![[포토] 하리무-나띠-박제니, MZ 핫걸](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7/PS24070300100t.jpg)
![[포토]"비싸도 팔리니까" 수시로 가격 올리는 명품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7/PS24070300520t.jpg)
![[포토] 증권회사 CEO 간담회 참석하는 이복현 원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7/PS24070300429t.jpg)
![[포토]'대화하는 추경호-배준영'](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7/PS24070300425t.jpg)

![[포토] 키자니아 찾은 노동진 수협중앙회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7/PS24070200972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