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석사는 신라고승 의상대사가 676년 창건한 사찰이다. 국내 최고(最古) 목조건물인 ‘무량수전’으로 유명한 부석사는 풍광이 가장 아름다운 절로도 꼽힌다. 일부러 일몰 시간에 맞춰 일주문에 도착했다. 오후 6시 30분. 저녁예불을 시작하는 시간이다. 사찰이 산지의 경사면에 지어진 탓에 제일 꼭대기인 무량수전에 오르기 위해선 9단의 석축을 올라가야 한다. “천왕문이 있는 맨 아래층은 지옥, 무량수전이 있는 꼭대기는 극락이라고 합니다. 한계단 한계단 오를 수록 수양하는 마음이 들지요” 해설사의 설명.
무량수전 앞 안양루에 섰다. 발 아래 소백산과 태백산줄기가 끝없이 펼쳐졌다. 저녁 노을이 구름에 물들어 운해(雲海)를 이루고 있었다. 하늘 아래서 산과 구름을 내려다 보는 극락세계에 온 것 같았다. 스님 한 분이 범종루에 들어섰다. 둥둥둥둥… 천천히, 그러면서도 깊이 있는 법고 소리가 경내에 울려 퍼졌다. 범종을 울리며 식을 마친 스님이 “절을 이리 소개하라”며 수첩에 가만히 적어준다. ‘부석사, 소백산자락 붉은 노을에 취하는 곳.’
가운데가 불룩한 배흘림 기둥이 버틴 무량수전은 편안하고 안정돼 보였다. 권화자 해설사는 “일반인은 잘 모르지만, 무량수전에서 신도들이 이용하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앞에 있는 배흘림 기둥에 전설이 있다”고 했다. 그 기둥을 3번 돌면 죽기 전 딱 3일만 아프다가 평화롭게 삶을 마칠 수 있다는 것. 몇몇 관광객들과 함께 기둥을 3번 돌았다.
 | |
| ▲ 오후 7시. 부석사 안양루에 서면 노을에 물든 구름이 내려다보인다. | |
 | |
| ▲ 소수서원의 천년(千年)솔밭. 소나무가 하늘까지 뻗어있다. | |
선비촌에서 서민의 일상을 체험했다면 바로 옆 소수서원(054-639-6693)에서는 고고한 유생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중종 37년(1542) 세워진 소수서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대학이다.지금도 4000명의 유생들이 수업을 들었던 강학당, 책을 보관하던 장서각 등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유생들이 공부를 하다 머리를 식혔다는 언덕, 소헌대에 올랐다. 그 옛날 욕심 없던 선비처럼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았다. 굵은 고송(古松)들이 하늘 끝까지 쭉쭉 뻗어 있는 소수서원 앞 솔밭을 걸었다. 소수서원 앞뜰 소나무 사이사이에 가을이 스며들고 있었다.


![월드컵까지 따냈다...스포츠산업 '생태계 파괴자' 된 빈살만[글로벌스트롱맨]](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3/11/PS23110500115t.jpg)

![[포토] 폭염 속 휴식취하는 건설 근로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3/08/PS23080100718t.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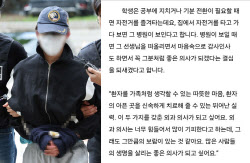


![[포토]'손하트하는 이재명-조희연'](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0800935t.jpg)
![[포토]코스피, 0.4% 상승…외인·기관 매수에 2740선 회복](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0800899t.jpg)
![[포토]'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정견발표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0800852t.jpg)
![[포토]오색연등으로 물든 조계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0800789t.jpg)
![[포토]추미애 당선인, '국회의장 출마'](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0800757t.jpg)
![[포토]중소·벤처 기업 글로벌화 대책 브리핑하는 오영주 장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0800624t.jpg)
![[포토]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0800469t.jpg)
![[포토]수지, 시원한 미소](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0700280t.jpg)
![[포토]어버이날 앞두고 카네이션 판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0700875t.jpg)

![[포토] 고군택 '어머니 사랑합니다'](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0800127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