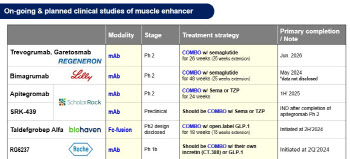[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주한미군 관련 문제에 관심이 모아진다. 북한이 철수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지위와 역할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과 동북아 지역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 입장에선 평화체제 이후 계속해서 주한미군이 주둔하는게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 문제는 결국 한미동맹의 조정 여부와도 관련돼 있어 가장 민감한 쟁점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북한은 지속적으로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해왔다. 지난 달에도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4일자 정세해설 기사에서 “남조선 인민들이 바라는 것은 불청객인 미제 침략군의 무조건적인 철수”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한·미 간 진행 중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관련 협상을 ‘한국 국민의 혈세를 강탈해낼 흉심’이라고 맹비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주한미군 주둔에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누차 강조한다. 지난달 29일에도 오하이오주에서 연설을 통해 “주한미군 3만2000여 명의 병력과 최고의 장비가 휴전선에 깔린 철조망을 우리가 보호해주고 있다”고 말해 주한미군 병력 규모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 | 지난 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병사식당에서 한미 양국 군 장병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
그동안 주한미군의 병력 규모와 역할은 수차례 변경돼 왔다. 1960~70년대 베트남전에서 발을 빼기 위한 명분으로 미국은 ‘우방국의 안보문제는 해당 국가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주한미군 병력을 감축했다. 이에 따라 휴전 이후 6만3000여명(실질 주둔병력 5만8000여명 내외)을 유지해오던 주한미군 병력은 1971년 3월 미 제7사단 철수로 2만명을 감축함으로써 4만3000명으로 줄었다. 카터 행정부에서도 3400여명의 주한미군이 미국으로 되돌아 갔고 부시 행정부에서도 7000여명을 줄였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역시 한국방위의 주도적 역할에서 지원적 역할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1991년 미 2사단 관할이던 판문점의 경계책임이 한국군에 이관됐으며 GP(경계초소) 2개소 중 1개소도 한국군이 인수했다. 한강 이북 중서부 전선을 지키던 미 2사단은 한강 이남으로 내려오고 미군 장성이 맡던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도 한국군 장성이 맡게 됐다. 한미연합야전군사령부는 해체 돼 서울 북방과 한국 서부 방어 임무가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로 이관됐다.
이같은 역사를 고려할 때 종전선언과 이에 따른 평화협정 체결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지역 내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조정자 역할로 전환하고, 지역 분쟁에 대비한 신속대응군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우리가 주한미군 철수나 조정 얘기를 먼저 꺼내들 필요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윤지원 평택대 외교안보전공 교수는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근간으로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주둔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남북한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북한의 비핵화가 없으면 주한미군 역할 전환이나 축소 논의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포토]이가영,부드러운 티샷 공략](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100330t.jpg)
![[포토] '트릭 오어 트릿' 진행하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2211t.jpg)
![[포토] 송민혁 '이글 2개, 버디7개 잡은 날'](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0152t.jpg)
![[포토]치솟던 배춧값 대폭 하락…"물량 충분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1370t.jpg)
![[포토]삼성전자 반도체 영업익 4조](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1369t.jpg)
![[포토]하모니카 연주가 이윤석의 연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1230t.jpg)
![[포토]민통선 주민들 트랙터 시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1122t.jpg)
![[포토] 서울시예산안 설명하는 오세훈 시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0890t.jpg)
![[포토] 벤틀리모터스코리아, '더 뉴 컨티넨탈 GT 스피드' 공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0418t.jpg)
![[포토] 2024 서울 문화원 엑스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001770t.jpg)
![[포토]이가영,정상을 바라본다](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100331t.jpg)

![[단독]대출 74%가 담보·보증대출…위험 피하는 은행](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100154b.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