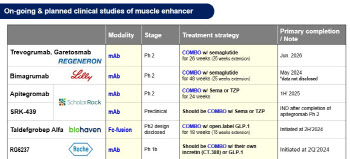|
소시에테제네랄은 아직 살아있으니 그나마 나은 축에 들지 모른다.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상업은행은 잘나가던 트레이더(외환 딜러)의 사고로 한순간에 파산했다. 1995년 베어링스은행 싱가포르 지점에 있던 20대 닉 리슨이 파생금융상품 불법거래로 13억달러(약 1조 4500억원)를 날려버린 것. 은행은 233년 역사를 접으며 단돈 1파운드에 네덜란드 ING그룹으로 매각됐다.
케르비엘과 리슨에겐 공통점이 있다. 사고 친 그날까지 젊은 패기로 연전연승했다는 것. 이성적이고 똑똑하던 이들이 그 시점에서 재앙 수준의 무모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뭔가. 그런데 만약 이 같은 치명적인 금융사고의 원인이 ‘생물학적 요소’에 있다면? 법정에 선 케르비엘은 이렇게 변명한 적이 있다. “쳇바퀴에서 정신을 잃은 햄스터처럼 잠시 현실감각을 잃고 지나친 모험을 감행했다.”
▲시스템 때문 아니다 호르몬 탓이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신경과학자인 저자는 월스트리트 베테랑 트레이더였다. 어느날 문득 그는 상승장과 하락장에서 트레이더들이 보이는 비이성적 행동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신분을 바꾼 건 2004년. 이때부터 금융시장과 인간생리의 연관성을 연구하기 시작한다. 리스크에 처했을 때 몸이 느끼는 판단력, 뉴로이코노믹스(Neuroeconomics)의 가능성을 타진한 셈이다.
저자의 목적엔 사람을 이성적 경제기계로 보는 시각이 실패했단 진단이 들어 있다. 호모이코노미쿠스가 허상에 불과한 걸 생물학으로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흔히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 ‘탐욕’이니 ‘이성적 분석오류’니 하는 관점에도 반한다. 분명 ‘흥분’을 야기하는 화학물질이 있으며 그것이 테스토스테론이란 거다.
▲“회사는 성과 좋은 직원 때문에 망한다”
승자효과 패턴대로 트레이더는 수익을 올릴 때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증가한다. 늘어난 수치는 자신감과 리스크를 향한 갈망에 불을 지펴 더 규모가 큰 매매에 나서게 한다. 유망한 트레이더가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 되는 건 이때부터다. 갈수록 ‘업’된 트레이더가 위험한 포지션을 매매하는 횟수가 잦아지고, 설사 수익이 떨어진다고 해도 트레이더, 경영진 모두 딱히 신경쓰지 않는 단계. 회사가 성과 좋은 직원으로 인해 몰락을 맞게 되는 순간이다.
▲시장의 생물학적 성격 바꿔야
또 다른 방법은 ‘야성’을 잠재우는 것이다. 비교치로 금융시장 내 ‘젊은 남성’ 대 ‘나이든 남성과 여성’을 들었다. 우선 워런 버핏, 벤저민 그레이엄 등 전설적인 투자자 대부분이 나이가 든 뒤 성공했단 점에 주시했다.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지는 시기다. 또 여성은 태생적으로 남성의 10~20% 정도만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한다. 승자효과에 덜 취약하단 얘기다.
이쯤에서 생기는 의문은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왜 금융계 여성비율은 5%에 불과한가다. 저자는 이를 남성이 트레이딩 플로어를 지배한 까닭으로 대신 설명한다. 여기서 이뤄지는 거래가 거의 단타 매매라는 것. 남성은 이런 종류의 빠른 의사결정과 매매의 신체접촉을 즐긴다는 거다.
하지만 이도 이젠 한계다. 빠른 결정은 컴퓨터가 하면 된다. 미래의 트레이더가 지녀야 하는 유일한 자질은 시장에 대한 판단력과 리스크에 대한 이해뿐이다. 그러니 여성과 중년 남성의 수를 늘려 금융시장의 생물학적 성격을 바꾸는 일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들이 나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팽배한 젊은 남성을 자제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양쪽 중 어디가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르다’는 것이 전부다. 다양성의 폭이 늘어날수록 시장은 안정된다는 논리다.










![[포토]이가영,부드러운 티샷 공략](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100330t.jpg)
![[포토] '트릭 오어 트릿' 진행하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2211t.jpg)
![[포토] 송민혁 '이글 2개, 버디7개 잡은 날'](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0152t.jpg)
![[포토]치솟던 배춧값 대폭 하락…"물량 충분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1370t.jpg)
![[포토]삼성전자 반도체 영업익 4조](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1369t.jpg)
![[포토]하모니카 연주가 이윤석의 연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1230t.jpg)
![[포토]민통선 주민들 트랙터 시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1122t.jpg)
![[포토] 서울시예산안 설명하는 오세훈 시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0890t.jpg)
![[포토] 벤틀리모터스코리아, '더 뉴 컨티넨탈 GT 스피드' 공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0418t.jpg)
![[포토] 2024 서울 문화원 엑스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001770t.jpg)

![[포토]이가영,정상을 바라본다](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100331t.jpg)
![[단독]대출 74%가 담보·보증대출…위험 피하는 은행](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100154b.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