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강가의 아침..강 너머 동쪽에서 동이 터오고 있다 | |
일단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간간이 물건을 파는 장사꾼들과 빨래하는 사람들, 물가에서 물장난 하는 아이들 정도가 전부였다.
걷다 보니 머리 윗쪽의 태양 열기보다 더 뜨거운 기운이 후끈 느껴졌다. 저 멀리서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을 보니 어느덧 화장 가트까지 왔나보다.
마니카르니카 가트. 화장 가트에서는 사진을 찍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연기를 보자 무의식적으로 카메라를 들어 렌즈캡을 떼어내고 초점을 맞췄다.
바로 불호령이 떨어졌다. 옆에 있던 인도인들이 여기서는 사진을 찍으면 안된다며 온 몸으로 막아섰다.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걸었다. 아까 사진찍는다고 눈을 부라렸던 인도인들은 계속 따라오면서 말을 건다.
화장가트 위에 서서 잠깐 보려 했지만 관광객은 이곳에서 보면 안된다며 위쪽 건물로 안내한다. 지금이 보기에 딱 좋은 시간이라며 건물 입구로 들어갈 것을 권하는데 그다지 내키지 않는다.
곧 시체를 태울 땔감으로 쓰일 통나무 더미 사이로 난 길을 따라 걸었다. 화장 가트 바로 옆에 있는 가트에 앉아 잠시 겐지스 강을 감상했다.
그다지 넓지 않은 강폭에 강 서쪽과 동쪽은 아주 상반된 모습이다. 강을 건너면 허허벌판 모래밭에 소들이 노닐고 있지만 서쪽에는 줄지어 있는 가트에 오래된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목욕을 하고, 빨래를 하고, 시신을 태운다.
한쪽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며 죽음이라는 게 뭘까 잠시 생각했다. 한쪽에서는 하나의 삶이 연기와 함께 한줌의 재로 변해가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마지막 삶이라도 붙잡아보려고 병든 몸을 성스러운 강물에 담그고, 또 한쪽에서는 아직 삶이 무엇인지 모를 개구쟁이 소년들이 물장난을 치는 곳.
어짜피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려면 강 상류로 올라가야 하니 배를 타기로 했다. 마침 해가 질 때도 됐으니 석양 감상도 할 겸 강바람도 쐴 수 있을 것 같았다.
배를 가져오겠다고 가더니 뱃머리에 왠 노인을 태워 왔다. 아버지란다.
 | |
| ▲젊어보이는 아버지(왼쪽)과 늙어보이는 아들(오른쪽) | |
아들이 노를 젓자 배는 스르르 앞으로 나아갔다. 노 젓는 게 쉽지는 않은 모양인지 금새 이마에 땀방울이 송송 맺혔다. 아버지는 뱃머리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분위기를 한껏 잡는다.
배는 출발하자마자 화장가트를 다시 지났다. 강 한가운데에서 보는 화장터는 느낌이 또 다르다. 섬뜩하다.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서인지 사진을 너무 찍고 싶었다. 배 위에서 슬며시 사진기를 꺼내들었는데 뱃사공도, 노인도 아무말 하지 않았다.
계단에는 주황색 천으로 씌운 시신 2구가 화장을 기다리고 있고 한쪽에서는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 또 다른 쪽에서는 이미 나무토막들이 땔감으로서의 수명을 다한 듯 마지막 불꽃을 태우느라 안간힘을 쓴다. 유족들은 말없이 불타는 모습을 바라만 보고 있고 재를 수습하는 불가촉천민들만 분주하다.
주변에 가득 쌓아놓은 통나무는 정확히 kg으로 재서 시신태우는 값으로 받는다니 죽는 순간까지 계산은 정확하다. 돈이 없으면 완전히 재가 되지 못한 상태로 세상을 뜨게 되는 것이다.
그래도 죽기 전에 바라나시로 와서 땔감을 살 돈을 구걸하다 죽어 신성한 겐지스강에 뿌려진다면 이만큼 행복한 죽음은 없다고 생각하는 인도인들이다.
화장가트 바로 앞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건물은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지내는 곳이라고 한다. 삶과 죽음의 길목에 선 그들, 매일 사그러들지 않는 불꽃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 죽음의 문턱에서 행복한 상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인도인 밖에 없을 것이다.
하얀 천에 둘둘 말린 사두의 시신, 현세에서 이미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사두는 화장하지 않고 그냥 강에 떠내려 보낸다고 한다. 아주 가까이서 본 시신, 또 다시 섬뜩함을 느낀다.
배는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 뱃머리에 앉아 있다, 옆으로 길게 누웠다가, 각종 포즈를 취해줬던 노인이 갑자기 배에 굴러다니던 페트병을 집어 강물에 푹 넣는다. 패트병 안에 들어있는 물은 녹색인데다 각종 부유물까지 훤히 보인다. 설마, 정말 저 물을 먹는걸까.
"그 물 뭐에 쓰게요?"
"마실려고.."
"마시기에 적당해 보이지는 않는데.."
"우리는 늘 겐지스 강물을 마시고 사는데 괜찮단다. 신성한 물이거든"
마침 저쪽 벽에 "Ganga is life"라는 글씨를 큼지막하게 써놓은 게 눈에 들어온다. 겐지스강의 또 다른 이름인 강가를 정화하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정화가 어느 정도 된 것일까.
그래도 머리속에서는 가이드북에서 읽은 내용이 떠나질 않았다. 겐지스 강물에서 추출한 샘플에서 100ml당 150만개의 배설물 대장균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목욕하기에 안전한 물이 되려면 이 수치가 500미만이 돼야 하는데...
보트는 여러 개의 가트를 거쳐 드디어 아씨 가트에 도착했다. 가트를 보면 이곳 바라나시야 말로 여러 종교가 공존하고 있음이 느껴진다. 힌두교 가트를 지나면 머리에 흰 모자를 쓰거나 검은 두건을 두른 이슬람 교도들이 모여있는 무슬림 가트가 나오고, 좀 지나면 자인교 가트가 나오고..
끼리 끼리 모여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겐지스강을 섬긴다. 저녁이 되니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해도 뉘엿뉘엿 지기 시작했고 강은 녹색에서 회색으로 변해간다. 어머니의 강은 오늘도 여러 사람들의 소망과 기원을 들어주고 어둠에 그렇게 묻혀져 갔다.
 | |
| ▲ 01.겐지스강은 인도인의 삶 02.사두의 장례식..하얀 천에 싸여 배에 묶인채 영원히 잠들 강가로 나아가고 있다 03.배 위에서 산 초와 꽃 04.기도를 하며 초와 꽃을 강가에 띄워보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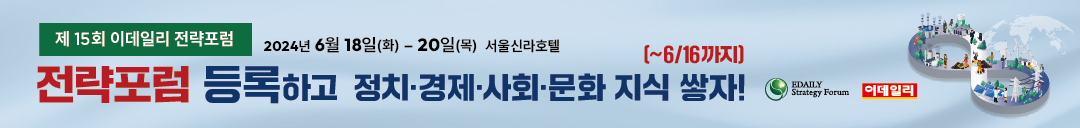

![월드컵까지 따냈다...스포츠산업 '생태계 파괴자' 된 빈살만[글로벌스트롱맨]](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3/11/PS23110500115t.jpg)

![[포토] 폭염 속 휴식취하는 건설 근로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3/08/PS23080100718t.jpg)






![[포토] 한우, 홍콩 MZ 인기](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0301093t.jpg)
![[포토] 한국P&G, 이마트 경품 기획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0300962t.jpg)
![[포토]'발언하는 서병수 선거관리위원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0300842t.jpg)
![[포토]LH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토론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0300783t.jpg)
![[포토] 경총,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0300771t.jpg)
![[포토]의원총회, '악수하는 나경원-이철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0300737t.jpg)
![[포토]서울시, "K-군인, 당신이 영웅"…서울꿈새김판 호국보훈의달 새단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0300657t.jpg)
![[포토]英 여성작가 캐서린 맨스필드의 시 ‘정반대’로 새 옷 입은 교보생명 광화문 글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0300618t.jpg)
![[포토] 암참(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0300617t.jpg)
![[포토]조국혁신당, '로텐더홀에서 첫 최고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0300390t.jpg)

![[포토]이예원, 우승 주먹 불끈](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0200429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