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6월 09일 일요일
[뉴욕=edaily 정명수특파원] `월스트리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 근사한 사무실, 멋진 옷, 엄청난 연봉 등등. 월스트리트를 움직이는 엔진 중의 하나가 바로 애널리스트다.
"이 주식을 사시오. 이 주식은 파시오" 유명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를 공개할 때마다 해당 종목들은 춤을 춘다. 몇 줄의 글로 전세계 투자자들을 울고 웃기는 애널리스트는 월가를 꿈꾸는 젊은이들에게는 선망의 직업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진정한 애널리스트의 세계는 어떤 것일까. `월스트리트 미트(Wall Street Meat)`라는 책이 묘사하는 애널리스트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다.
이 책의 저자 앤디 케슬러는 1985년 파인웨버를 시작으로 모건스탠리, CSFB 등에서 20여년간 기술주 분석을 담당했던 애널리스트다.
케슬러는 벨연구소 출신의 공학도다. 처음부터 애널리스트가 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초년병 애널 시절부터 그는 `요지경 월스트리트`를 비판적으로 바라 볼 수 있었다.
그가 월가에서 만나, 함께 일했던 사람들 중에는 잭 그룹먼, 프랭크 쿼트론, 헨리 블로짓, 메리 미커 등이 포함돼 있다. IT 버블 시대 월가를 주름잡던 기술주 분석가들이다.
메리 미커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은 애널리스트가 아니다. 엘리어트 스피처 뉴욕주 검찰총장이 파헤친 `거짓 리포트 사건`으로 현직에서 쫓겨나거나,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내야할 처지가 됐다.
케슬러가 바라본 월가 애널의 세계에는 신비감이라고는 전혀 없다.
◇며느리도 모르는 주가
케슬러는 벨연구소의 경력을 인정받아 반도체 업종 담당자가 됐다. 인텔, AMD 등 자신이 맡은 기업을 탐방하고 돌아온 케슬러가 처음으로 리포트를 작성하게 됐다.
케슬러는 한 선배 애널에게 물었다.
"밥, 주식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죠?"
선배는 "아하. 주식의 기초를 가르쳐줄 때가 됐군. 지금 기업 수익을 다루려는 것이지. 그렇다면 간단하지. 주식의 가치란 미래 수익의 총합에 지나지 않는거야."라고 명쾌하게 말한다.
케슬러는 "그게 전부인가요"라고 되묻는다.
밥이 말한다. "좋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지. 내년도 기업 이익은 올해 기업 이익보다는 가치가 덜 나가지. 왜냐.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잖아. 그 만큼 가치를 디스카운트해야지. 미래 수익의 총합을 구하기 전에 디스카운트를 해야만 한다구."
케슬러의 의문은 계속된다. "이제야 이해가 가는군요. 그런데요. 어떻게 미래 수익을 디스카운트 하죠?"
밥은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쓰지"라고 말한다.
"아하. 여기 공식이 있군요.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뭐죠?" 케슬러는 머리를 긁적 거린다.
밥은 "경우에 따라 달라지지. 인플레이션, 금리 등등 변수가 많이 있지"라고 말한다.
케슬러는 "월스트리트저널같은 데를 보면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나와있나요"라고 묻는다.
밥은 "그렇다면 너무 쉽지"라며 빙긋 웃는다.
"그럼 이건 도대체 무슨 숫자죠" 케슬러는 점점 더 알 수 없다는 표정이다.
"누구도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얼마인지는 몰라. 그게 바로 주식시장을 신비스럽게 하는 거지. 누구도 어떤 기업의 미래 수익을 알 수는 없다구. 그리고 특정한 디스카운트 레이트도 없지. 모든 애널리스트들은 자기자신만의 숫자를 만들어. 결국, 주식의 가치가 얼마인지 진정한 답은 없는 것이지."
케슬러는 황망하게 선배를 바라봤다.
◇애널=엔터테이너
`기관투자자(Institutional Investor)`라는 잡지가 있다. 월가에서는 이 잡지를 이니셜을 따서 `II`라고 부른다. II는 70년대부터 `All American Research Analyst Poll`이라는 것을 해왔다.
매년 5월이 되면 II는 수백명의 바이 사이드(Buy Side) 투자자들에게 "각 분야별 최고의 애널 3명을 선정해달라"며 폴을 실시한다.
이 폴에 선정된 이른바 `우수 애널`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가 그 기관의 리서치 파워를 대변한다. 월가의 애널들은 이 폴에 선정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케슬러가 소속된 파인웨버도 예외는 아니었다. 동료 애널은 이렇게 말했다. "분명히 알아야할 것이 있어. 너는 분석가가 아니야. 너는 엔터테인먼트 직업을 선택한 거라구."
II 폴과 리포트의 정확성과는 상관관계가 높지 않다. 케슬러의 선배는 II 폴에 선정되는 비법을 이렇게 정리했다.
"전화, 방문, 리포트, PR, 아참, 잊을 뻔 했군. 분석의 정화도."
월가 증권사 리서치센터들은 대부분 `한달에 100통화(100 Phone Calls a month program)` 정책을 쓰고 있다. 애널들에게 톱 100위 드는 투자기관에 최소한 한달에 한번 전화를 하라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물론 애널들의 전화 내역은 기록으로 남겨지고, 데이터 베이스로 관리된다. 월가 애널들은 자신의 근무시간 중 절반이상을 `전화걸기`에 할당하고 있다.
신기하게도 `전화걸기`는 II 폴에서 위력을 발휘한다. 케슬러는 전화걸기를 무척 싫어했다. 시간을 너무 잡아먹는데다, 전화걸기에 집착하다보면 자신이 맡은 업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흐름을 놓칠 때도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전화걸기와 비슷한 방식으로 "1년에 한번, 또는 두번 맡은 기관을 방문한다"는 원칙도 있다. 애널을 맞이하는 기관투자자들의 반응도 가지각색이다. 묵묵부답형이 있는가 하면, 설명 중에 꾸벅꾸벅 조는 펀드매니저도 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리포트를 가지고 오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고약한 매니저도 있다.
전화걸기와 방문 사이사이에 애널 본연의 임무(?)인 `리포트`를 써야한다. 리포트는 내용이 어떻든 일단 보기가 좋아야한다. 수많은 애널들이 비슷한 내용의 리포트를 만들어서 투자자들에게 보내기 때문에 튀지 않으면 읽히지 않는다.
케슬러는 한 펀드매니저의 사무실에서 6피트(182센티미터) 높이로 쌓인 리포트 더미를 본 적도 있다. 이 매니저의 전화기에는 전화메일 저장 기능이 있었는데, 오전 11시만 되면 전화메일이 꽉차버렸다. 100통화 한도가 오전 중에 다 소진되는 것이다.
◇"튀고 싶다구, 그럼 언론을 이용해"
이런 치열한 경쟁에서 애널들이 II 폴에 선정되는 진정한 비법은 뭘까. 리포트와 전화만으로는 매니저들의 눈에 띠는데 한계가 있다.
정답은 바로 언론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의 고정 칼럼인 `Heard on the Street` 담당자한테서 전화라도 받는다면 자신의 이름이 인용될 수 있도록 `확실한 것`을 기자에게 알려줘야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리포트에도 쓰지 않은 진짜 근사한 아이디어를 기자에게 살짝 흘려줄 필요도 있다. 기관투자자들은 나중에 기사를 보고 투덜대기도 한다.
"왜 우리 회사가 당신네 증권사에 수백만달러씩 수수료를 내야하는 거죠. 75센트만 내면 당신 리포트의 핵심 내용을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볼 수 있는데."
케슬러 자신도 `언론 플레이`로 이름을 널리 알린 경험이 있다. 1987년 케슬러는 마이크론테크놀로지를 탐방했다. 당시 마이크론 CEO였던 조 파킨슨의 집에서 저녁을 먹을 기회를 잡았다. 케슬러는 마이크론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파킨슨 사장은 자신만만했다. "일본 반도체 회사들의 도전이 만만치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인텔도 손을 들었으니까요. 우리는 인텔과는 달라요. DC가 우리 편이거든요."
"DC(워싱턴DC)가 우리 편이라구" 케슬러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다.
케슬러는 미국전자협회에 전화를 걸어서 DC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탐문하기 시작했다. 피트 윌슨 상원의원이 주도가 되서 일본 반도체 기업에 대한 덤핑 제재가 기획되고 있었던 것이다.
케슬러는 반도체 업계에 엄청난 사건이 벌이지고 있음을 눈치챘다. 리서치 회의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말했다. 리서치 팀장은 "그럼, 반도체 주가가 올라가는거야, 떨어지는거야"라고 물었다.
케슬러는 "글쎄요. 알 수 없죠"라고 얼버무렸다. 팀장은 "확신이 서면 다시 말해"라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케슬러는 곧바로 평소 알고 지내던 뉴욕타임즈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며칠후 뉴욕타임즈 1면에 "레이건 행정부가 일본 반도체 업체에 대한 무역제재를 준비중"이라는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렸다. 기사 중에 케슬러의 코멘트가 인용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케슬러는 ABC방송의 `나이크라인`에 게스트로 초청되기도 했다.
◇파이터를 원하는 월가
초년병 애널 시절 케슬러의 옆방에서는 잭 그룹먼이 통신업종 담당자로서 명성을 쌓아가고 있었다. 그룹먼은 AT&T 출신으로 AT&T의 분기 실적을 1센트까지 알아맞히는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월가에는 세가지 타입의 애널이 있다. 1)자신이 맡은 업종의 핵심 사항을 잘 알고 있는 그 누군가를 알고 있는 애널 2)자신이 맡은 업종 자체를 잘 알고 있는 애널 3)업종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는 애널.
그룹먼은 통신업종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고, 업계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룹먼이 AT&T의 분기 실적 전망치를 어떻게 내놓느냐에 따라 AT&T 주가가 달라졌다. 그룹먼은 당시 마젤란펀드를 맡고 있던 피터 린치에게 핸드폰 시장에 대한 특별 강의를 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그룹먼은 한 때 필라델피아에서 골든 글러브 복싱 선수로 활약했었다. 거친 운동을 한 탓에 그룹먼은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레스토랑에서 웨이터가 신속하게 주문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는 것을 케슬러가 말리기도 했다.
한번은 AT&T의 분기 실적이 그룹먼이 예측한 것보다 2센트 적게 발표된 적이 있었다. 그룹먼은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서 "Goddamn, sonofa(son of a bitch), shit, goddamn.." 등을 연발하더니, 전화기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월가에는 운동선수 출신 애널이나 트레이더가 많다. 월가 격언에 이런 것이 있다. "훌륭한 트레이더를 찾으려면 퀸즈로 택시를 타고 가라. 택시 미터기가 10달러가 됐을 때 거리에서 만난 첫번째 사람을 고용해라."
퀸즈는 뉴욕 맨해튼의 외곽 지역으로 원래는 공장지대였다. 거리 생활에 익숙한 주먹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동네다.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월가에서 성공하려면 `파이터`가 제격이라는 뜻이다.
그룹먼은 통신업계 애널로 승승장구, 시티살로먼스미스바니의 스타 애널로 성장한다. 시티그룹의 샌디 웨일 회장과도 긴밀한 관계가 된다. 그룹먼은 그러나 스피처 검찰총장의 칼을 맞고, 부와 명예를 모두 잃었다. 샌디 웨일 회장도 `거짓 리포트 스캔들`에 연루돼 시티그룹의 CEO 직에서 물러나야했다.
월가는 고상한 경제 담론을 논하는 아카데믹한 곳이 아니다. 권모술수와 욕설이 난무하는 시장판이다. 그 곳에서 성공하려면 남들과 다른 뭔가가 있어야한다.
주요뉴스
저작권자 © 이데일리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 1 "GPT, 나 우울해서 빵샀어" 말했더니…남편보다 나은 AI와의 대화[잇:써봐]
- 2 “성관계 거부해서” 베트남서 한국 여성 살해한男, 알고보니
- 3 "명확한 답 준다"는 아브레우 박사… '영일만 석유' 의문들 해소될까
- 4 [속보]아브레우 박사 “탐사 성공률 20%…5번 시추하면 1번 발견 가능”
- 5 ‘왕초보’ 안유진도 마음 놓고 탄다…‘지락실’ 럭셔리 연수용 차는[누구차]
- 6 임신한 아내 집에 두고…헌팅포차 다닌 대학생 남편 [사랑과 전쟁]
- 7 'K팝 혁신가' 민희진, 사는곳도 '힙'하네 [누구집]
- 8 '마약하지 않겠다' 전두환 손자 전우원, 근황 공개
- 9 “죽으면 책임진다니까”…고의 사고로 응급차 막은 택시 기사 [그해 오늘]
- 10 [속보]아브레우 박사 “경제성 있는 ‘탄화수소’ 못 찾은 것은 리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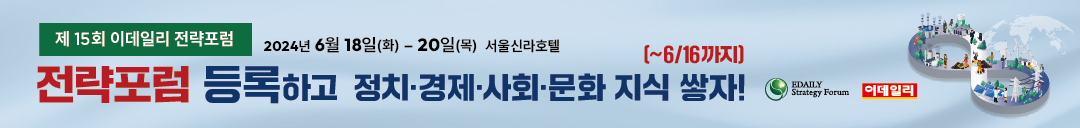

![월드컵까지 따냈다...스포츠산업 '생태계 파괴자' 된 빈살만[글로벌스트롱맨]](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3/11/PS23110500115t.jpg)

![[포토] 폭염 속 휴식취하는 건설 근로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3/08/PS23080100718t.jpg)






![[포토]박민지,구름 관중 앞에서 우승 향한 샷](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0900444t.jpg)
![[포토]대한의사협회, '18일 전면 휴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0900286t.jpg)
![[포토]의료개혁 관련 질의에 답하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0900248t.jpg)
![[포토]주유소 기름값 내림세 지속···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 '고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0900185t.jpg)
![[포토]배달의민족, ‘2024 장보기오픈런’](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0900172t.jpg)
![[포토]이승연,파워 임팩트](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0800521t.jpg)
![[포토] 이규민 '최고 대회, 최고의 샷으로 우승 도전'](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0800181t.jpg)
![[포토]장은수,조준은 확실하게](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0800002t.jpg)
![[포토] KPGA 선수권대회 한우 바비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0700810t.jpg)
![[포토]서울비댄스페스티벌, 스케이보더의 시범](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0700785t.jpg)
![[르포]최고 車시트 위한 가혹 테스트…현대트랜시스 시트연구센터 가보니](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0900417t.jpg)
![[포토] 전가람 '최고 대회, 최고의 세레머니'](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0900481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