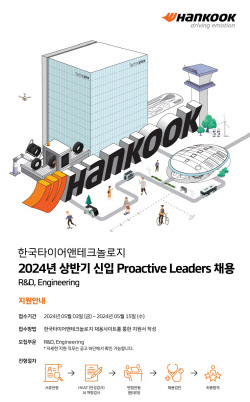|
이에 따른 급성·만성 중독으로 여러 직업병에 이환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도입된 것은 1964년입니다. 당시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00인 이상인 제조업과 광업에만 적용됐습니다. 산재법 제정 전인 1959년부터 대한석탄공사에서 진폐증에 대해서는 보상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 무렵에는 진폐증을 제외한 직업병에 대해 산재임을 쉽게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요. 1966년부터 가동돼 1993년 폐업한 A사 인견공장에서 다수 근로자가 동시에 콩팥손상, 사지마비, 언어장애 등의 증상을 겪게 됐습니다.
근로자들이 이황화탄소(CS₂) 중독임을 인지하고 산재신청을 요구하자 사업주가 산재임을 부정하했는데요. A사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집단적으로 투쟁한 결과 1988년 근로자 21명에 대해 직업병임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는 진폐증과 소음성 난청에 이어 세 번째로 인정된 직업병입니다. 이후 계속된 투쟁으로 현재 1000명에 가까운 피해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됐는데요. 이는 현재까지 국내 최대 규모의 독성물질에 의한 직업병 발병 사례로 꼽히며 2010년부터는 이황화탄소중독증을 진단받은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산업재해임을 비교적 빠르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에는 휴대전화 스크린 제조 공장에서 냉각제로 메탄올을 사용해 근로자 다수가 시신경 또는 중추신경에 손상을 입어 실명하거나 뇌병변 장애를 얻게 됐습니다. 2022년 3월에는 트리클로로메탄에 급성으로 중독된 근로자 16인이 간 손상을 입는 일이 있어 중대재해처벌법과 맞물려 한동안 화재가 되기도 했다. 이렇게 급·만성 중독에 따른 직업병은 아주 다양한 화학인자에 의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소를 소화기관으로 섭취하게 되면 마비·경련·혼수 등으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 회복하더라도 말초신경염과 골수기능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입을 통한 섭취로 일어나는 급성중독도 치명적이지만 호흡기관을 통한 흡입으로 발생하는 만성중독은 그 증상이 즉각적으로 발병하지 않을 뿐 비소에의 노출이 지속될 경우 폐암, 피부암 등이 발병해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성적인 중독의 경우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 체내에 이미 많은 양의 비소가 축적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각심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속제련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구리 등의 가공과정에서 그 부산물로 비소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비소에 노출되기 때문에 스스로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보호장구를 잘 착용하고 일반·특수건강검진을 꾸준히 받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월드컵까지 따냈다...스포츠산업 '생태계 파괴자' 된 빈살만[글로벌스트롱맨]](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3/11/PS23110500115t.jpg)

![[포토] 폭염 속 휴식취하는 건설 근로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3/08/PS23080100718t.jpg)







![[포토]뱅크시 작품에 대해 소개하는 유한일 상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0901052t.jpg)
![[포토]'대화하는 윤재옥-이철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0901021t.jpg)
![[포토] 이태희 '호쾌한 스윙으로'](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0900260t.jpg)
![[포토]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생중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0900686t.jpg)
![[포토]여전한 고금리 시대, 황금기 맞은 사모대출이란 주제로 열린 패널토론](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0900648t.jpg)
![[포토] 티파니 영, 매력적인 미모](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0800221t.jpg)
![[포토]'손하트하는 이재명-조희연'](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0800935t.jpg)
![[포토]코스피, 0.4% 상승…외인·기관 매수에 2740선 회복](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0800899t.jpg)
![[포토]'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정견발표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0800852t.jpg)
![[포토]오색연등으로 물든 조계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0800789t.jpg)
![[포토] 김홍택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0900280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