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말을 맞아 서울에서 멀지 않은 섬 하나를 찾았다. 목적지는 인천 중구에 있는 무의도.
인천국제공항에서 222번 버스를 타고 무의도선착장을 거쳐 5분여 배를 타고 들어가면 만나는 곳이다.
섬의 이름을 본 순간 마음이 동했다. 반복되는 일상의 피로감과 누적된 그리움의 무게를 훌훌 털고, '무심(無心)'의 경계로 다시금 자신을 돌려줄 것만 같았다.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선 전철을 타고, 공항에서 다시금 택시를 타서야 겨우 막배 시간을 맞출 수 있었다. 무의선착장에 도달했을 때 세상은 해의 여광에 물들어 더없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같은 장소라도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그것과 조우하는 일은, 마치 많고 많은 인연 중에 단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과 닮았다. 그래서 여행자는 풍광 앞에서 감동하고 설레인다.
|
배는 금세 뭍에 닿았다. 이제 막 어스름이 내리기 시작한 섬은 적막했다.
속살 드러낸 갯벌 위에 비스듬히 누운 배들은 마치 제 할일을 끝내고 바다 앞에 선 늙은 어부와 닮았고, 저 멀리 수평선을 향해 밀려나간 바닷물은 그리움을 좇아 홀로 울고 있는 이의 뒷모습과 흡사했다. 그리고 이제 막 간판을 밝히는 횟집들의 불빛은 홀로 깨어 어미를 찾는 아이의 눈과 닮아 괜스레 마음이 짠해졌다.
주말의 짧은 여행, 더없이 편한 벗과 함께 와 숙소에 짐을 풀고 그저 발길 닫는 술집 한 곳에 자리를 잡았다.
옛 말에 한 평생 벗은 하나로 족하다 했던가. 사는 일이 바빠 오래도록 만나지 못한 벗이지만 그저 어제도 만난 듯 익숙하고, 그렇다한들 지겹거나 할 말이 궁색하지도 않다.
술만이 아닌 그 무언가에 취하고 또 취해 밤이 깊어갔다.
둘째날 아침, 가벼운 숙취를 느끼면서 서둘러 숙소를 나섰다. 마음을 내서 온 곳이니 만큼 섬 곳곳을 꼼꼼히 둘러보고 싶었다.
첫 장소는 숙소에서 멀지 않은 실미해수욕장. 초승달 모양의 모래사장과 아름드리 소나무가 옹기종기 모인 해변가는 이른 해수욕을 즐기는 관광객들로 제법 붐비고 있었다.
해변가에서 지척에 보이는 실미도는 바닷길이 열리면 금세 걸어갈 수 있을 만큼 가까웠으나 물때를 맞추지 못해 그저 바라보는 수밖에 없었다.
아직도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지난 역사의 파편. 유골조차도 가족 품에 안기지 못한 무고한 젊은이들의 넋이 바다 건너 어디선가 흐느끼고 있을 것만 같다. 아픈 역사는 기억하는 자에게 슬픔과 의무를 전한다.
해수욕장 입구 왼편에는 연인들에게 더없는 낭만을 선사할 방갈로가 줄지어 서 있고, 반대편 끝에는 몇 해 전 인기리에 방영된 권상우·최지우 주연의 드라마 <천국의 계단> 세트장이 세워져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었다. 그 외에도 말마차와 4륜자동차, 수상보트 등 다양하게 바다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놀이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작은 섬을 여행하는 장점은 여유롭게 길을 걸어도 하루이틀 안에 주변을 다 둘러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 높지 않은 산 정상에 서면 아담한 섬 하나가 한 눈에 들어오니 서두를 것도 아쉬울 것도 없이 그저 만족스러울 뿐이다.
오후 무렵, 다시 일상으로 복귀해야 하는 여행자의 마음은 그제서야 바빠진다. 해변을 빠져나와 간단히 밥을 먹고 일부러 선착장에서 멀리 내려 벗과 함께 천천히 걷는다.
서로의 역사를 고스란히 아는 벗과의 여행. 이 여행에서 돌아간다 한들 마음 속에 가시지 않는 그리움과 혼자만이 짊어져야할 삶의 무게가 덜해지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놓인 그 숱한 문들을 다시금 열고 싶은, 열 수 있는 설레임과 용기를 갖고 돌아가는 것이다.
앞서 걷는 벗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 세상, 참으로 짧고도 감동스럽구나…' 실없는 생각을 해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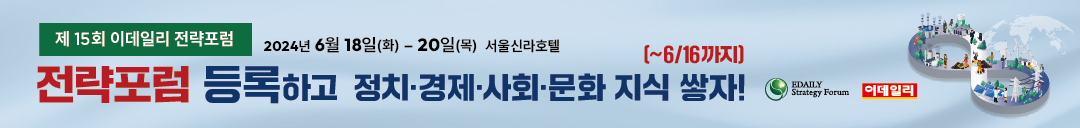

![월드컵까지 따냈다...스포츠산업 '생태계 파괴자' 된 빈살만[글로벌스트롱맨]](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3/11/PS23110500115t.jpg)

![[포토] 폭염 속 휴식취하는 건설 근로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3/08/PS23080100718t.jpg)









![[포토] 민관합동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2200839t.jpg)
![[포토]국토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규모·선정기준 발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2200749t.jpg)
![[포토]더위 식히는 분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2200691t.jpg)

![[포토] 청계광장 단오 홍보행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2200647t.jpg)
![[포토]국내외 AI 기업, 안전한 AI 사용 위한 '서울 기업 서약' 발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2200572t.jpg)
![[포토]'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진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2200564t.jpg)
![[포토]최고위, '모두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2200418t.jpg)
![[포토]첫 출근하는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2200394t.jpg)
![[포토]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2100856t.jpg)

![[포토]매치퀸 박현경 '힘들었지만 최고의 하루'](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1900488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