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이차전지(배터리) 소재 국산화라는 표현을 경계했다. 우리나라가 핵심 광물이나 소재 분야도 배터리와 비슷한 인식을 두고 그 자체를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해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박 연구원은 “이차전지용 핵심 광물인 리튬, 니켈이나 필수 소재인 양극재·음극재·전해질·분리막은 소재기업들 스스로가 해외 기업들과 비교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다만, 아직 국내 소재 산업 경쟁력이 약한 부분이 있으니 단기간 내 역량 강화를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
박 수석연구원은 “국내 배터리 산업의 밸류체인을 살펴보면 조달, 수요 측면이 약점”이라며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듯이 일본에는 근소하게 뒤처지거나 비슷한 양상이고, 중국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취약하다. 수요 측면에서는 내수시장의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골드만삭스의 분석 자료를 보면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도 2028년 자국 내에서 배터리를 전량 생산하고 조달할 수 있을 전망이나, 소재는 100% 역내 조달이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는 “2030년에도 미국과 유럽 현지에서 생산되는 소재는 필요량 대비 양극재는 25%, 음극재는 13%에 불과할 전망이고 핵심 광물은 말할 것도 없다”며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낮아지긴 하겠지만, 핵심 광물과 소재 분야는 배터리에 비해 많은 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박 연구원은 배터리 소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그는 “중국 기업들의 핵심 광물 매장량이나 채굴량 점유율은 높지 않으나 정제-제련과 소재 제조에서 글로벌 점유율이 높은데, 지금까지 어떻게 경쟁력을 키우며 점유율을 높여 왔는지의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이때 자국의 이차전지, 소재 분야까지도 경쟁력을 키웠다”며 “양극재는 2012~2016년 4년간 자국 내 생산량을 4만4000톤(t)에서 16만2000t으로, 음극재는 2만8000t에서 12만3000t으로 4배 가까이 불렸다. 현재 중국의 압도적인 글로벌 점유율에는 이 시기가 큰 영향을 줬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중국의 사례처럼 핵심 광물을 채굴해 정제, 제련을 거쳐 소재까지 제조하는 과정을 하나의 큰 산업으로 보고 육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 연구원은 “소재 산업은 이차전지에 종속적이며 의존적인 경향이 강하다”며 “원료에서 소재까지의 산업이 스탠드 얼론(Stand-alone) 할 수 있어야 중국 기업들과 비교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월드컵까지 따냈다...스포츠산업 '생태계 파괴자' 된 빈살만[글로벌스트롱맨]](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3/11/PS23110500115t.jpg)

![[포토] 폭염 속 휴식취하는 건설 근로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3/08/PS23080100718t.jpg)








![[포토]뱅크시 작품에 대해 소개하는 유한일 상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0901052t.jpg)
![[포토]'대화하는 윤재옥-이철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0901021t.jpg)
![[포토] 이태희 '호쾌한 스윙으로'](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0900260t.jpg)
![[포토]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생중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0900686t.jpg)
![[포토]여전한 고금리 시대, 황금기 맞은 사모대출이란 주제로 열린 패널토론](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0900648t.jpg)
![[포토] 티파니 영, 매력적인 미모](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0800221t.jpg)
![[포토]'손하트하는 이재명-조희연'](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0800935t.jpg)
![[포토]코스피, 0.4% 상승…외인·기관 매수에 2740선 회복](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0800899t.jpg)
![[포토]'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정견발표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0800852t.jpg)
![[포토]오색연등으로 물든 조계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0800789t.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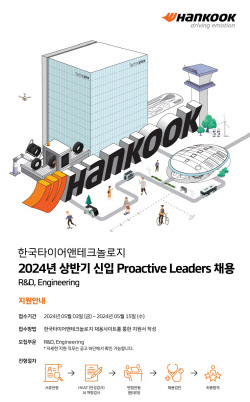
![[포토] 김홍택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0900280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