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경기)=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감히 상상은 해볼 일인가. 세 사람 중 하나가 떠나고 둘만 남는 그 상황을. 그러니 청천벽력이라고 해두자. ‘빈자리가 어쩌구’ 하는 것도 사치스럽다. 비수처럼 꽂힌 지독한 비운을 한 사람이 다 끌어안은 셈이니. 떠난 그도, 남은 그들도 세상의 어떤 충격이 이보다 더할까.
강석호(1971∼2021), 노충현(51), 서동욱(47), 세 작가가 의기투합한 건 지난해 여름이었다. 3인전을 꾸려보자고 했던 건데. 누가 먼저 말을 꺼냈는지도 ‘가물’ 하지만 그게 대수겠나. 드디어 입 밖에 낸 그 ‘선언’을 믿고 착착 진행해왔다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전시는 코앞에 다가왔고, 세 사람은 막판 준비를 위해 또 머리를 맞댔나 보다. “미뤘던 전시명을 정한 날”이었다고 했다.
‘먼 사람, 사람, 가까운 사람’이란 테마는 그날 나왔다. 셋 다 마음에 들어했단다. 사실 그렇다. 닮았지만 전혀 다른, 다르지만 묘하게 닮은 세 작가의 작품세계를 드러내기에 그만한 압축도, 표현도 없다. 셋 다 사람을 그렸지만 셋 다 다른 사람을 그린, 그들이 뭉친 ‘3인전’이라니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다. 그런데 그날이 마지막 만남이 되고 말았다. 며칠 뒤 강석호 작가의 부음이 날아왔다. 전시 개막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때였다.
아무도 의도하지 않아 ‘불의’라고 한다. 세상의 모든 말 못 할 사연을 구겨넣은 그 한 단어 ‘불의’의 사고로 강 작가는 세상을 떠났다. 가까스로 정신을 추스른 노 작가와 서 작가의 고민이 왜 없었겠나. 3인전을 추모전으로 바꿔야 할 의무감도 생겼을 거다. 오랜 얘기 끝에 결론을 냈다. ‘끝까지 3인전’으로 가기로. ‘먼 사람, 사람, 가까운 사람’ 전은 그렇게 오픈을 했다.
|
뒤늦게 연락을 받고 경기 파주시 헤이리예술마을 갤러리소소로 향했다. 한낮 더위가 채 가시지 않은 평일 오후, 차분하지만 가라앉진 않은, 허전하지만 공허하진 않은 전시장 분위기가 찾는 이들을 맞고 있었다. 강 작가 32점, 노 작가 7점, 서 작가 12점 등, 엉켜놔도 튀지 않고 서로에게 묻어가는 회화작품 50여점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말을 걸고 있었다.
3년 만에 연 ‘3인전’…닮은 듯 다른 화풍 50여점 나란히
“저 그림 속 인물이 석호 형입니다.” 기타를 가슴에 끌어안은 채 한 손으론 코드를 잡고 한 손으론 줄을 튕기고 있는 한 사내를 가리키며 서 작가가 한 말이다. 저 얼굴, 반쯤 가려졌지만 미처 감추진 못한 표정이 읽힌다. ‘나, 강석호는 지금 즐겁다’ 한다. ‘멜로디 3’(2021)이란 타이틀을 단, 서 작가의 작품은 층과 층을 연결하는 전시장의 핵심 통로에 걸렸다. ‘연주에 푹 빠진’ 그 석호 형의 얼굴을 보지 않고선 전시를 둘러볼 수 없는 ‘요지’다. 어쩔 수 없이 이번 전시는, ‘없는 그’가 중심이다.
|
이토록 많은 ‘사람 이야기’, 작정한 기획일까. “한 사람은 멀리서, 한 사람은 표준렌즈로, 한 사람은 크롭(잘라내기)으로 사람을 그린다. 처음에는 그 인물의 크기에 대해 말했더랬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크기가 아니고 ‘거리’더라. 거리가 들어오면서 여백이 생겼고 대상과 거리에 대한 얘기가 자연스럽게 연결됐다.” 노 작가가 말한 ‘멀리서’는 노 작가 자신을, ‘표준렌즈’는 서 작가, ‘크롭’은 강 작가를 말하는 거다. 바로 전시명 ‘먼 사람, 사람, 가까운 사람’을 끌어낸 바탕인 셈이다.
그 끝에 서 작가가 보충을 달았다. “물리적 거리보다 심리적 거리를 말하는 거다. 석호 형은 아예 조형적 대상으로 인물을 본 듯하고, 나는 초상화란 형식 자체로 모델과의 친밀한 거리감을 만든 것이고. 또 충현 형은 풍경이란 장치로 잘 보이지도 않는 사람을 그 안에 들인 거다. 셋 다 거리를 확보하려고 노력한 셈이다.”
이게 ‘따로 또 같이’가 아닌가. 비단 걸어둔 그림만이 아니다. 세 작가의 행보가 그랬다. 한 곳에 있지만 다른 곳을 내다봤고, 다른 곳을 향해도 언제든 한데 묶일 것을 꿈꿨다. 이처럼 자유로운 거리감이 어디 있겠는가. 의도적으로 맞춘다는 게 더 어려울 이 지점은 세 작가가 우연찮게 친해진 계기기도 했다.
|
“1990년대 대학을 다닐 때 구상회화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2000년대 초중반 미술계가 달라지면서 문을 열어준 셈이다”(노). “그 작업을 시작한 시기가 비슷했다. 2006년 즈음, 나와 석호 형이 해외서 막 귀국했을 때고 충현 형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붓을 잡았을 때다. 코드가 맞고 공유할 취향이 많더라”(서).
그렇게 서울대 미대 출신(강석호), 홍익대 미대 출신(노충현·서동욱)의 의욕 넘치는 신진작가들이 ‘기념비적인 연합모임’을 결성한 건데. 만날 때마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꿰뚫는 지난한 ‘대화’로 불꽃을 튀긴 모양이다. “주로 석호·충현 형은 TV 드라마에 대해, 나와 석호형은 음악과 오디오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눴다고 하니. 그 결실이 2018년 나왔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수애뇨339에서 첫 ‘3인전’을 연 거다. 전시명이 ‘다이얼로그’(대화). “결과보다 과정이 좋았다”고 입을 모은 그 전시 이후 ‘따로’에 바빠진 셋은 늘 ‘같이’를 그리워했고, 가까스로 이번 ‘3인전’을 성사시켰던 거다.
|
서정적이지만 단단한 붓질로 크고 작은 캔버스에 세 작가가 채워 넣은 건 이거다. 사람 속의 사람, 사람 속의 풍경, 풍경 속의 사람.
‘사람 속의 사람’을 그린 건 서 작가다. 세워두고 앉혀두고 눕혀두고, 애써 보지 않으려 해도 그대로 눈에 들어오는 우리가 늘 봐온 사람들이 주인공이다. 하지만 그들은 손을 뻗는다고 잡을 순 없는 딱 그만큼의 거리를 두고 있다. 사실 그들이 멈춰선 건 아닌 듯하다. 작가다. 서 작가가 막는 거다, 더는 오지 말라고.
‘사람 속의 풍경’은 강 작가에 속해 있다. 사람 안에 든 풍경을 잘라내 그리는 작업을 했다는 뜻이다. 허리, 가슴, 손, 또 그 손이 쥐고 있는 사과·큐브까지. 가장 즐겨 그린 건 배꼽 언저리인데. 길쭉한 배꼽, 동그란 배꼽, 튀어나온 배꼽 등은 가장 가깝지만 가장 먼 거리기도 하다. 그 풍경이 누구의 것인지 알 수가 없으니.
|
‘풍경 속의 사람’은 노 작가의 작업이다. 흥건히 빗물이 고인 장마철 강가, 자동차 바퀴자국이 야무지게 난 어느 밤의 눈길. 그 풍경들에 손톱만큼 박아낸 사람을 기어이 주시하게 만든다. 점과 실루엣뿐이어도 사람의 온기를 빼내려 안달을 부리는 건 되레 우리다. 노 작가가 계산 없이 그어낸 그 거리를 좁히려고.
유난스럽게 ‘함께’를 외쳤던 사이는 아니었다. “거리를 두는 게 진짜 관계”(노)라고, “거리를 두다 보면 초점이 맞춰진다”(서)고 여긴 그들의 신념 덕에. 그래서 그들이 서로를 더듬어낸 ‘함께’는 무엇보다 중요했을 거다. 뒤돌아오는 길, 두 작가 중 누군가 했던 말이 계속 맴돌았다. “지나고 보니 전시명을 잘못 지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먼 사람’ 때문에 강 작가가 떠나버린 듯해서. 그냥 ‘큰 사람, 중간 사람, 작은 사람’으로 할 걸 그랬나 봐요.” 전시는 19일까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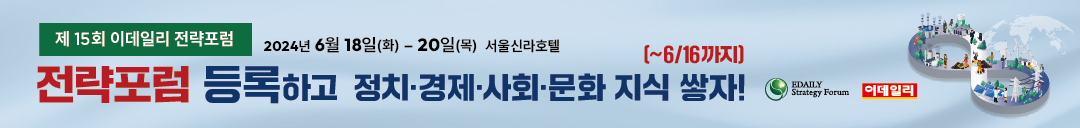

![월드컵까지 따냈다...스포츠산업 '생태계 파괴자' 된 빈살만[글로벌스트롱맨]](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3/11/PS23110500115t.jpg)

![[포토] 폭염 속 휴식취하는 건설 근로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3/08/PS23080100718t.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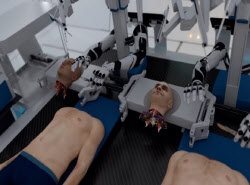



![[포토]이수진 '장타로 시작합니다'](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0100634t.jpg)
![[포토] 김민규 '매치킹 원하는 한국오픈 챔프'](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0100539t.jpg)
![[포토]장민규 '온그린을 기대한다'](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3100522t.jpg)
![[포토] 고군택 '일본에서부터 좋은 샷감을 이어간다'](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3100483t.jpg)
![[포토]민희진 어도어 대표 주총 관련 기자회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3100853t.jpg)
![[포토] 안전한국훈련 참가한 조성명 강남구청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3100678t.jpg)
![[포토] H&M 피팅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3100293t.jpg)
![[포토]검찰 송치되는 김호중 소속사 본부장](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3100059t.jpg)
![[포토] 허인회 '2승을 달리다'](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3000205t.jpg)
![[포토] 이마트, 영업시간 변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3000858t.jpg)
![[포토]정남수 '러프가 깊지는 않네'](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0100904t.jpg)
![[이車어때]나무 들이받고, 트럭과 충돌해도…고객 목숨 살린 차](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0100154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