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6월 11일 화요일
[edaily 박동석 양효석기자] 연금의 앞 길은 가시밭길이다. 100년이 넘는 연금 역사를 갖고 있는 선진국들은 멀지 않은 우리나라 연금의 자화상이다. 선진국의 연금은 우리보다 더 한 중병을 앓고 있다.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대신 부양받아야 할 노인수가 급증하는 고령화현상은 선진국의 연금을 재정만 축내는 골칫거리로 내몰고 있다. 중환자 신세다.
이 때문에 선진국들은 죽어가는 연금을 살려내기 위한 대수술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연금부실을 더 방치할 경우 정권마저 위협당할 것이란 위기감의 발로다.
개혁의 이름으로 이뤄지는 수술의 방향은 정도의 차이일 뿐 모두가 똑같다. 어떻게든 지금보다 연금부담(보험료율)을 늘리고 혜택(급부액)은 줄이는 쪽이다.
정부는 과거와 달리 미래를 위해 고통을 분담하자고 호소하고는 있지만 국민들이 당장 금전상 손해가 뻔한 개혁을 달가워할 리 만무다. 그럴꺼면 그동안은 왜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속여왔느냐는 반감이 들끓고 있다. 파업의 연속, 시위의 연속이다.
유럽에서도 노(勞)-정(政)갈등은 예사롭지가 않다. 그러나 갈등의 양상이 예전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정치인들은 더이상 연금의 마술을 입에 담지 못하고 있다. 연금을 후하게 주겠다는 표밭갈이용 공약을 꺼낼 용기가 없어서다. 연금이 깎일 것을 우려해 거리로 뛰쳐나온 퇴직자들이나 부담이 높아질 것이 두려워 머리띠를 두른 근로자들의 목소리도 한풀 꺾이고 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
◇ 프랑스의 선택
시위의 천국 프랑스에서는 2003년 7월 노조불패의 신화가 깨지기도 했다.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프랑스 근로자들마저 정부의 연금개혁 앞에 무릎을 꿇은 이유는 한 가지다. 저출산과 노동력 감소, 노인인구 증가라는 고령화 태풍 앞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연금수술의 열풍은 독일과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을 시작으로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물론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 의회는 지난해 7월 24일, 4월부터 논란을 끌어오던 연금제도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노동자들의 연금 납입기간을 현재의 37.5년에서 오는 2008년까지 40년으로, 2020년까지 42년으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이 개혁안의 골자다. 그동안 노동계는 연금개혁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개혁안이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라며 파업과 시위로 맞섰으나 국민여론은 장 피에르 라파렝 중도우파 정부의 연금개혁 필요성 주장으로 기울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연금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한 것은 정부의 철저한 준비와 강한 의지 때문이었다. 프랑스는 리오넬 조스팽 사회당 총리가 집권하던 1998~2000년 사이 연평균 3.6%의 쾌속성장을 기록했으나 세계적 경기침체에다 동거정부 내 불협화음이 커지면서 2001년 성장률이 2.1%, 2002년엔 1.2%로 추락했다. 2002년 우여곡절 끝에 재선에 성공한 자크 시라크 대통령으로선 쓰러진 경제 추스르기가 그의 제1과제가 아닐 수 없게 됐다.
◇ 독일 “많이 내고 적게 가져가라”
아젠더 2010을 앞세워 독일병 치유에 나선 독일도 지난 3월 11일 노령연금 수령액 감축을 골자로 하는 연금법개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독일 연금 개혁도 프랑스와 다를 게 없다. 연금 재정을 더 지탱할 수 없으니 “많이 내고 적게 가져가라”는 것이다. 세금공제전 최종 임금대비 연금 수준을 현재의 53%에서 2020년까지 46%로 낮추고, 2030년까지 다시 43%로 하향 조정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도 현행 65세에서 67세로 늦췄고, 조기에 받을 수 있는 최소 연령 역시 기존 60세에서 63세로 연장됐다. 울라 슈미트 보건사회부 장관은 “앞으로 연금이 노령자들의 기본 생활비를 보장해주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의 말은 노후생활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고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다가왔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 연금 수술 도미노
오스트리아의 볼프강 쉬셀 총리가 이끄는 연정은 연금개혁을 추진하다 50여년 만의 총파업과 연정 붕괴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03년 4월 29일 쉬셀 총리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은 ▲연금 수령시기를 60세에서 67세로 늦추고 ▲보험료 납부기간을 40년에서 45년으로 늘리며 ▲벌과금을 강화해 조기은퇴를 억제한다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맞선 오스트리아 노조의 저항은 거세다. 원래 조합주의 전통이 강한 노조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총파업에 나선 것만 봐도 투쟁의 다짐이 얼마나 강한지 짐작할 만하다.
스위스도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연금재정 축소에 대처하기 위해 퇴직연령을 현재의 65세에서 67세로 늘리고 연금지급액도 줄이는 개혁안을 2005년 중반 의회에 제출할 계획을 밝힌 상태다.
연금개혁에 대해 조급증을 보이는 것은 미국이라고 별반 다를 게 없다. 미국의 고민은 기업들의 연금기금이 경기침체와 주가하락, 고령화, 조기퇴직 증가 등으로 빈사상태로 빠져드는 데 있다. 미 연방연금보증회사인 펜션베니피트개런티는 기업들의 연금기금 적자 누적부족분을 300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백악관은 기업들의 연금부담액을 줄여주는 대신 연금기금의 운영실태를 공개토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 OECD “그래도 더 고쳐라”
일본은 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연금을 못 내는 미납자가 급증해 국민연금이 붕괴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국민연금 납부 거부자는 지난 1990년대 초반에만 해도 10%를 다소 웃도는 수준이었으나 2002년에는 37.2%에 달해 납부율이 1961년 연금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60%대로 떨어졌다. 기업도산과 실업으로 납부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늘어난 탓도 있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것도 큰 원인이다.
일본 정부의 처방은 유럽과 다를 게 없다. 일본 정부는 연금납입료를 인상하고 지급액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고령화라는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고려할 때 연금개혁은 갈 길이 멀다고 충고하고 있다.
OECD는 지난달 11일 펴낸 ‘2004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유럽 국가들이 경기 침체기에 초래된 재정적자의 악순환을 끊지 못해 유럽중앙은행(ECB)과 성장 협약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로권 핵심 국가들의 연금개혁 시도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 연금 수술 도미노
오스트리아의 볼프강 쉬셀 총리가 이끄는 연정은 연금개혁을 추진하다 50여년 만의 총파업과 연정 붕괴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03년 4월 29일 쉬셀 총리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은 ▲연금 수령시기를 60세에서 67세로 늦추고 ▲보험료 납부기간을 40년에서 45년으로 늘리며 ▲벌과금을 강화해 조기은퇴를 억제한다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맞선 오스트리아 노조의 저항은 거세다. 원래 조합주의 전통이 강한 노조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총파업에 나선 것만 봐도 투쟁의 다짐이 얼마나 강한지 짐작할 만하다.
스위스도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연금재정 축소에 대처하기 위해 퇴직연령을 현재의 65세에서 67세로 늘리고 연금지급액도 줄이는 개혁안을 2005년 중반 의회에 제출할 계획을 밝힌 상태다.
연금개혁에 대해 조급증을 보이는 것은 미국이라고 별반 다를 게 없다. 미국의 고민은 기업들의 연금기금이 경기침체와 주가하락, 고령화, 조기퇴직 증가 등으로 빈사상태로 빠져드는 데 있다. 미 연방연금보증회사인 펜션베니피트개런티는 기업들의 연금기금 적자 누적부족분을 300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백악관은 기업들의 연금부담액을 줄여주는 대신 연금기금의 운영실태를 공개토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 OECD “그래도 더 고쳐라”
일본은 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연금을 못 내는 미납자가 급증해 국민연금이 붕괴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국민연금 납부 거부자는 지난 1990년대 초반에만 해도 10%를 다소 웃도는 수준이었으나 2002년에는 37.2%에 달해 납부율이 1961년 연금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60%대로 떨어졌다. 기업도산과 실업으로 납부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늘어난 탓도 있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것도 큰 원인이다.
일본 정부의 처방은 유럽과 다를 게 없다. 일본 정부는 연금납입료를 인상하고 지급액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고령화라는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고려할 때 연금개혁은 갈 길이 멀다고 충고하고 있다.
OECD는 지난달 11일 펴낸 ‘2004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유럽 국가들이 경기 침체기에 초래된 재정적자의 악순환을 끊지 못해 유럽중앙은행(ECB)과 성장 협약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로권 핵심 국가들의 연금개혁 시도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주요뉴스
저작권자 © 이데일리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 1 “돈 많대서 결혼…” 20살 연상 남편 살해한 어린 신부[그해 오늘]
- 2 “자신감 어디서 나오나?” 질문에…‘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 3 "떡볶이값 아껴 호텔가요" 날 위한 소비에 자영업 위기①[소비양극화]
- 4 ‘신선한 시신 있어요’ 가톨릭의대 60만원에 해부학 강의 논란
- 5 “변호사 책상 위 ‘체액’ 든 종이컵” 항의하자…“밤꽃냄새 환장해”
- 6 "동해 유전 성공률 대단히 높다" 액트지오 한국 홈피, 알고보니
- 7 "어머니 치매 심해지자"...바다 추락 SUV, 알고보니
- 8 [속보]오세훈 "GS건설, 위례신사선 사업 포기"
- 9 “75억원 어치, 아무도 안가져가…‘김호중’ 때문에 난감하네”
- 10 우리은행, 또 터진 횡령사고.. 100억대 빼돌린 직원(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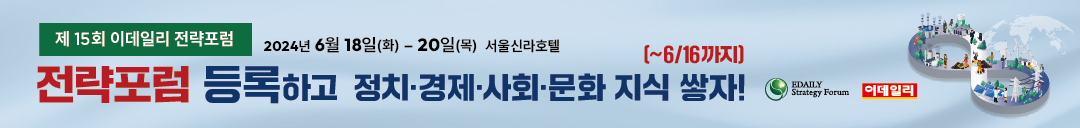

![월드컵까지 따냈다...스포츠산업 '생태계 파괴자' 된 빈살만[글로벌스트롱맨]](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3/11/PS23110500115t.jpg)

![[포토] 폭염 속 휴식취하는 건설 근로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3/08/PS23080100718t.jpg)






![[포토]착륙하다 멈춰선 아틀라스 항공 화물기](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1100680t.jpg)
![[포토]조미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인사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1100660t.jpg)
![[포토]'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1100593t.jpg)
![[포토] 제32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1100501t.jpg)
![[포토]의원총회 참석한 추경호-배준영](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1100494t.jpg)
![[포토]박찬대, '11개 상임위 즉시 가동...부처보고 불응시 청문회 추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1100458t.jpg)

![[포토]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추경호-박찬대 회동'](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1000855t.jpg)

![[포토] 전가람 '최고 대회, 최고의 세레머니'](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0900481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