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24회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17일간 열전을 뒤로 하고 막을 내렸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폐회식은 20일 밤 9시(한국시간) 중국 베이징 국립경기장에서 열렸다.
개회식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거장 장이머우 감독이 총연출을 맡은 폐회식은 거대한 눈꽃송이 성화대와 함께 시작됐다. 중국 국기와 함께 국가가 연주되면서 본격적인 폐회식의 시작을 알렸다.
곧이어 각국 선수들이 순서에 상관없이 하나가 돼 경기장 안으로 입장했다. 한국은 기수 차민규를 비롯해 총 36명(임원 21명 선수 15명)이 함께 했다.
대형 화면에는 대회를 빛낸 선수들의 열정적인 순간들을 모은 영상이 흘러나왔다. 이어 성공 개최의 숨은 공로자인 자원봉사자들의 모습도 소개됐다.
바흐 IOC 위원장의 폐회사에 이어 역대 가장 작은 성화로 기록된 베이징 대회 성화가 서서히 꺼졌다. 잠시 후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지면서 올림픽의 대미를 장식했다.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1년 연기돼 지난해 치러진 2020 도쿄 하계올림픽에 이어 ‘팬더믹 올림픽’으로 열렸다. 특히 이번 대회는 엄격한 방역통제 시스템 속에서 운영됐다. 올림픽 관련자들은 대회 기간 내내 외부와 차단된 채 ‘폐쇄루프’ 안에서 생활했다. 그 덕분에 대회는 코로나 대확산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됐다. 하지만 지나친 통제와 감시로 인해 각국 선수단의 불만을 낳기도 했다.
이번 대회에는 91개 나라, 29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7개 종목 109개 금메달을 놓고 열전을 벌였다. 사우디아라비아, 아이티 등 겨울이 없는 나라가 처음으로 동계올림픽에 출전했다. 총 여자 선수 비율은 2892명 중 1314명(45.4%)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대회 기간 내내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회이기도 했다. 미국, 영국 등 서방국가는 중국 내 인권 상황을 문제 삼아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다. 개회식에서는 한복을 입은 여성의 출연으로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졌다.
대회 후반에는 러시아올림픽위원회 여자 피겨선수 카밀라 발리예바의 금지약물 파문이 불거져 올림픽 정신이 얼룩졌다.
한국 선수단은 초반 오심 등 악재에도 금메달 2개, 은메달 5개, 동메달 2개를 수확, 종합 14위를 차지했다. 대회 전 목표인 ‘금메달 1∼2개 종합 15위 내 진입’을 달성했다.
황대헌(강원도청)과 최민정(성남시청)이 쇼트트랙에서 금메달 2개를 수확하는 등 빙상 종목에서 선전하며 한국의 메달 레이스를 이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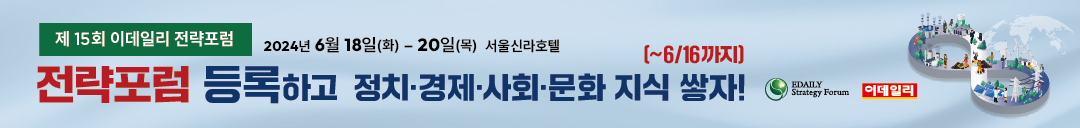

![월드컵까지 따냈다...스포츠산업 '생태계 파괴자' 된 빈살만[글로벌스트롱맨]](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3/11/PS23110500115t.jpg)

![[포토] 폭염 속 휴식취하는 건설 근로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3/08/PS23080100718t.jpg)







![[포토]조국혁신당, '로텐더홀에서 첫 최고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0300390t.jpg)
![[포토]최고위, '모두발언하는 이재명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0300384t.jpg)
![[포토] 권은비, 워터밤 2024 더현대 서울 팝업스토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0200376t.jpg)
![[포토]추경호,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0200317t.jpg)
![[포토] 조우영과 김민규 '다른 자세, 같은 생각'](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0200266t.jpg)
![[포토]홍예은 '상큼 브이로 출발'](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0200238t.jpg)
![[포토]"또 내렸다"...주유소 기름값 하락세 지속](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0200273t.jpg)
![[포토]한강에서 배우는 요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0200268t.jpg)
![[포토]'행복한 하루'](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0200232t.jpg)
![[포토]'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0200177t.jpg)

![[포토]이예원, 우승 주먹 불끈](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0200429t.jpg)